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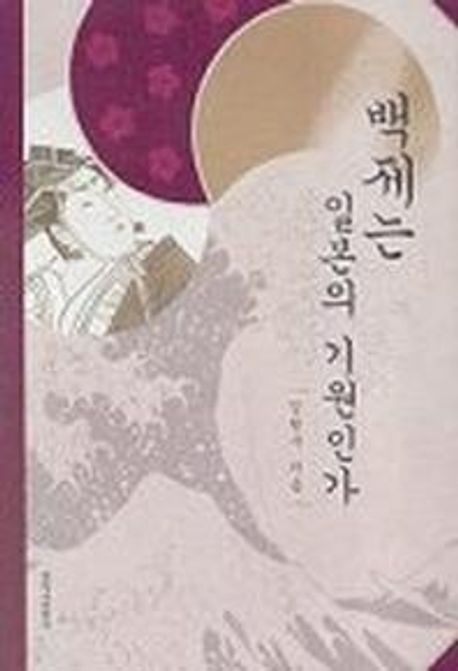
-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저자 : 김현구
출판사 : 창작과비평사
출판년 : 2002
ISBN : 9788936482251
책소개
얼마 전 일본 천황 아끼히또(明仁)가 자신을 백제의 후손이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한 번 일본과 백제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캄무천황과 천황가의 모계백제설을 다룬 보도가 줄을 이었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도 제작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은이 김현구(金鉉球) 교수는 한일합방의 역사적 근거로 동원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언급하며,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과 일본은 한 조상에서 갈라진 형제이므로 강제합방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이나 천황가에 백제의 피가 섞였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나 모두 같은 범주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중.일을 아우른 풍부한 문헌과 당시의 정세를 바탕으로1500년 전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1부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비롯된 '용병' 관계였으며, 일본은 백제뿐 아니라 당(唐)과 신라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벌였음을 입증한다. 2부에서는 백제계의 후손인 캄무천황(桓武天皇)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천황과 천황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은이 김현구(金鉉球) 교수는 한일합방의 역사적 근거로 동원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언급하며,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과 일본은 한 조상에서 갈라진 형제이므로 강제합방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이나 천황가에 백제의 피가 섞였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나 모두 같은 범주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중.일을 아우른 풍부한 문헌과 당시의 정세를 바탕으로1500년 전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1부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비롯된 '용병' 관계였으며, 일본은 백제뿐 아니라 당(唐)과 신라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벌였음을 입증한다. 2부에서는 백제계의 후손인 캄무천황(桓武天皇)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천황과 천황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아끼히또의 고백, 한국과 일본이 상반된 반응
얼마 전 일본 천황 아끼히또(明仁)는 자신의 예순여덟번째 생일날 이런 말을 했다. "나 자신과 관련해서는 캄무천황(桓武天皇)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 캄무천황(일본의 50대 천황)의 어머니인 타까노노니이까사(高野新笠)가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淳陀太子)의 자손이라는 것을 천황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방한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평에도 불구하고, 모계백제설(母系百濟說) 발언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측의 반응은 판이했다. 이미 많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만세일계의 황통사상에 대한 금기 중의 금기를 천황이 앞장서서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은 우리의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에 대한 고대의 콤플렉스를 공론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캄무천황과 천황가의 모계백제설을 다룬 보도가 연이었고, 심지어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학문적으로 채 입증되지 않은 오오진천황(應神天皇)이나 케이따이천황(繼體天皇), 사이메이천황(齊明天皇) 등의 백제인설(說)까지 소개했다. 요컨대 어떻게 해서라도 천황가가 백제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싶은 것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고대 콤플렉스를 되새김질하고 싶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근현대 콤플렉스를 고대의 우월성을 통해 해소하려 한 것은 아닐까.
한중일 각국의 사료와 객관적 정세로 당시를 읽다
저자 김현구(金鉉球) 교수는 이 대목에서 한일합방의 역사적 근거로 동원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언급하며, 객관적 판단의 절실함을 강조한다. 한국과 일본은 한 조상에서 갈라진 형제이므로 강제합방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이나 천황가에 백제의 피가 섞였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나 모두 같은 범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제와 일본이 어떤 틀 속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일본의 '습관적인 침묵'과, 양은냄비 같은 우리의 '과장된 반응'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 책에서 1500년 전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풍부한 문헌과 당시의 정세를 바탕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일본고대사와 한일관계사를 전공한 학자답게 우리의 사료는 물론 일본과 중국의 사료까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 논지를 전개한다. 물론 논지 전개의 필요조건은 사료의 적합성과 역사적 개연성이다. 한국과 일본의 사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는 일본의 사료가 조작되었다는 '편리한 언급'으로만 치닫지 않는다. 그보다는 사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높은 결론을 도출한다. 그래서 그의 글에서는 역사소설 한 편을 읽었을 때와 같은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당시의 정황을 재조직한 후, 타당성을 근거로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서술방식 때문이다.
예컨대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유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근거라 내놓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대목대목을 그들의 사료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치 스에마쯔 야스까즈(末松保和)가 정리한 임나일본부설을 도리어 {일본서기}의 내용으로 반박한 김석형(金錫亨, 북한의 저명한 역사학자)의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론'처럼 말이다(본문 1부 3장 참고).
이런 시각은 백제 왕실과 일본 황실이 어떤 관계를 맺었고, 한반도 사람들은 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건너가서 무엇을 하였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데까지 이어진다.
당시 백제와 일본은 특수한 '용병'관계였다
그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비롯된 '용병'관계였다는 점을 주목한다. 즉 백제는 일본에 필요한 선진문물을, 일본은 백제가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관계였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도일한 한반도계가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한반도계와 일본계의 혼인관계 역시 특정한 정치적 배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립되었다고 본다. 요컨대 일방적인 시혜관계가 아님을 분명히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점은 일본 천황가의 혈통에 집착하는 한국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또 당시의 일본이 백제와만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경향도 실증적으로 비판한다. 백제와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 시기와 정세에 따라 백제뿐 아니라 당(唐)·신라와도 접촉하는 등 생존을 위해 다양한 외교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더불어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다이까개신(大和改新) 직후 도일한 김춘추(金春秋)의 행적을 좇아 백제와 신라, 일본과 당이 얼마나 숨가쁘게 외교관계를 맺고 끊었는지를 살피는 대목은 퍽 흥미롭다.
그와 함께 제2부에서는 현 천황 아끼히또가 언급한 캄무천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쿄오또(京都)로 천도했을 뿐 아니라 헤이안신궁(平安神宮)에 신으로 모셔져 있는 캄무천황의 태생에 얽힌 이야기와 자신의 여관(女官, 천황의 거처에서 천황을 모시던 여자관리)까지도 백제계를 고집한 까닭, 백제계를 중용한 이야기 등을 사료를 통해 재현해내고 있다.
패전에도 불구하고 천황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1997년 여름에 무척 흥미로운 고백록이 발견되었다. 연합군사령부 최고사령관이었던 매카서(D. MacArthur)의 비서로 근무하다 퇴역한 패러스와 당시의 천황 히로히또(裕仁)의 비서였던 테라사끼 히데나리(寺崎英成)의 유품에서 발견된 {성담배청록(聖談拜廳錄)}이 그것이다. 패전 후 히로히또가 구술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고백록에는 종전 직전 패러스가 중심이 되어 폈던 심리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천황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반면, 군(軍)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일본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연합군측이 일본군의 지휘부가 천황을 속여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는데, 그 효과가 엄청났다. 연합군이 일본을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황이란 존재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 전범이라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히로히또에게 면책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에피쏘드를 비롯해 이 책의 제3부에서는 천황과 천황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패전 직후 거행한 히로히또의 '인간선언'과 그의 아들 아끼히또가 1989년 행한 '신이 되는 의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천황과 쇼오군(將軍)의 관계, 양위(讓位)가 없는 천황제, 천황의 권한, 황실의 생활, 천황제를 둘러싼 논쟁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얼마 전 사망한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의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과 미즈노 유우(水野祐)의 '삼왕조교체설'의 관계, 메이지헌법에 반영되었던 천황대권주의(天皇大權主義)와 그를 비판한 미노베 타쯔끼찌(美濃部達吉)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 등에 얽힌 이야기는 천황과 천황제를 놓고 일본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역사인식의 왜곡문제를 푸는 적절한 해법
저자는 이른바 '민족감정'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위치(한국인 일본사 연구자)에 서 있다. 또 그는 한일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역사인식의 왜곡 문제를 풀자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그의 글은 우리의 단선적인 민족감정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설득력있게 비판한다. 또 그의 객관적인 시각과 맛깔스런 문체, 흥미로운 구성은 1500년 전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싸고 펼쳐진 국제질서의 양상을 생생하게 재현해낸다. 한번 잡으면 단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독서 후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그가 우리의 역사인식을 향해 던지는 문제들이 적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현구(金鉉球)
1944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일본사를 전공하고, 1985년 와세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 고대사와 한일관계사 분야의 권위자이다. 저서로는 {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吉川弘文館 1985), {임나일본부 연구}(일조각 1993), {동아시아 사상의 보수와 개혁}(신서원 1995, 공저),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창작과비평사 1996) 등이 있고, 토오꾜오대학에서 펴낸 {일본사 개설}을 공역하기도 했다. 현재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연구실 3290-2372 / 017-717-8195)
얼마 전 일본 천황 아끼히또(明仁)는 자신의 예순여덟번째 생일날 이런 말을 했다. "나 자신과 관련해서는 캄무천황(桓武天皇)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 캄무천황(일본의 50대 천황)의 어머니인 타까노노니이까사(高野新笠)가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淳陀太子)의 자손이라는 것을 천황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방한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평에도 불구하고, 모계백제설(母系百濟說) 발언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측의 반응은 판이했다. 이미 많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만세일계의 황통사상에 대한 금기 중의 금기를 천황이 앞장서서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은 우리의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에 대한 고대의 콤플렉스를 공론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캄무천황과 천황가의 모계백제설을 다룬 보도가 연이었고, 심지어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학문적으로 채 입증되지 않은 오오진천황(應神天皇)이나 케이따이천황(繼體天皇), 사이메이천황(齊明天皇) 등의 백제인설(說)까지 소개했다. 요컨대 어떻게 해서라도 천황가가 백제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싶은 것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고대 콤플렉스를 되새김질하고 싶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근현대 콤플렉스를 고대의 우월성을 통해 해소하려 한 것은 아닐까.
한중일 각국의 사료와 객관적 정세로 당시를 읽다
저자 김현구(金鉉球) 교수는 이 대목에서 한일합방의 역사적 근거로 동원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언급하며, 객관적 판단의 절실함을 강조한다. 한국과 일본은 한 조상에서 갈라진 형제이므로 강제합방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이나 천황가에 백제의 피가 섞였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나 모두 같은 범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제와 일본이 어떤 틀 속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일본의 '습관적인 침묵'과, 양은냄비 같은 우리의 '과장된 반응'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 책에서 1500년 전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풍부한 문헌과 당시의 정세를 바탕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일본고대사와 한일관계사를 전공한 학자답게 우리의 사료는 물론 일본과 중국의 사료까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 논지를 전개한다. 물론 논지 전개의 필요조건은 사료의 적합성과 역사적 개연성이다. 한국과 일본의 사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는 일본의 사료가 조작되었다는 '편리한 언급'으로만 치닫지 않는다. 그보다는 사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높은 결론을 도출한다. 그래서 그의 글에서는 역사소설 한 편을 읽었을 때와 같은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당시의 정황을 재조직한 후, 타당성을 근거로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서술방식 때문이다.
예컨대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유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근거라 내놓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대목대목을 그들의 사료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치 스에마쯔 야스까즈(末松保和)가 정리한 임나일본부설을 도리어 {일본서기}의 내용으로 반박한 김석형(金錫亨, 북한의 저명한 역사학자)의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론'처럼 말이다(본문 1부 3장 참고).
이런 시각은 백제 왕실과 일본 황실이 어떤 관계를 맺었고, 한반도 사람들은 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건너가서 무엇을 하였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데까지 이어진다.
당시 백제와 일본은 특수한 '용병'관계였다
그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비롯된 '용병'관계였다는 점을 주목한다. 즉 백제는 일본에 필요한 선진문물을, 일본은 백제가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관계였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도일한 한반도계가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한반도계와 일본계의 혼인관계 역시 특정한 정치적 배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립되었다고 본다. 요컨대 일방적인 시혜관계가 아님을 분명히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점은 일본 천황가의 혈통에 집착하는 한국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또 당시의 일본이 백제와만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경향도 실증적으로 비판한다. 백제와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 시기와 정세에 따라 백제뿐 아니라 당(唐)·신라와도 접촉하는 등 생존을 위해 다양한 외교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더불어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다이까개신(大和改新) 직후 도일한 김춘추(金春秋)의 행적을 좇아 백제와 신라, 일본과 당이 얼마나 숨가쁘게 외교관계를 맺고 끊었는지를 살피는 대목은 퍽 흥미롭다.
그와 함께 제2부에서는 현 천황 아끼히또가 언급한 캄무천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쿄오또(京都)로 천도했을 뿐 아니라 헤이안신궁(平安神宮)에 신으로 모셔져 있는 캄무천황의 태생에 얽힌 이야기와 자신의 여관(女官, 천황의 거처에서 천황을 모시던 여자관리)까지도 백제계를 고집한 까닭, 백제계를 중용한 이야기 등을 사료를 통해 재현해내고 있다.
패전에도 불구하고 천황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1997년 여름에 무척 흥미로운 고백록이 발견되었다. 연합군사령부 최고사령관이었던 매카서(D. MacArthur)의 비서로 근무하다 퇴역한 패러스와 당시의 천황 히로히또(裕仁)의 비서였던 테라사끼 히데나리(寺崎英成)의 유품에서 발견된 {성담배청록(聖談拜廳錄)}이 그것이다. 패전 후 히로히또가 구술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고백록에는 종전 직전 패러스가 중심이 되어 폈던 심리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천황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반면, 군(軍)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일본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연합군측이 일본군의 지휘부가 천황을 속여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는데, 그 효과가 엄청났다. 연합군이 일본을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황이란 존재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 전범이라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히로히또에게 면책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에피쏘드를 비롯해 이 책의 제3부에서는 천황과 천황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패전 직후 거행한 히로히또의 '인간선언'과 그의 아들 아끼히또가 1989년 행한 '신이 되는 의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천황과 쇼오군(將軍)의 관계, 양위(讓位)가 없는 천황제, 천황의 권한, 황실의 생활, 천황제를 둘러싼 논쟁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얼마 전 사망한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의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과 미즈노 유우(水野祐)의 '삼왕조교체설'의 관계, 메이지헌법에 반영되었던 천황대권주의(天皇大權主義)와 그를 비판한 미노베 타쯔끼찌(美濃部達吉)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 등에 얽힌 이야기는 천황과 천황제를 놓고 일본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역사인식의 왜곡문제를 푸는 적절한 해법
저자는 이른바 '민족감정'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위치(한국인 일본사 연구자)에 서 있다. 또 그는 한일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역사인식의 왜곡 문제를 풀자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그의 글은 우리의 단선적인 민족감정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설득력있게 비판한다. 또 그의 객관적인 시각과 맛깔스런 문체, 흥미로운 구성은 1500년 전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싸고 펼쳐진 국제질서의 양상을 생생하게 재현해낸다. 한번 잡으면 단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독서 후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그가 우리의 역사인식을 향해 던지는 문제들이 적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현구(金鉉球)
1944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일본사를 전공하고, 1985년 와세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 고대사와 한일관계사 분야의 권위자이다. 저서로는 {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吉川弘文館 1985), {임나일본부 연구}(일조각 1993), {동아시아 사상의 보수와 개혁}(신서원 1995, 공저),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창작과비평사 1996) 등이 있고, 토오꾜오대학에서 펴낸 {일본사 개설}을 공역하기도 했다. 현재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연구실 3290-2372 / 017-717-8195)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부 천상의 나라에서 일본열도로
제1장 백제왕실과 일본 천황가의 인연/13
제2장 현해탄을 건너서/33
제3장 임나일본부설은 어떻게 생겨났나/50
제4장 백제에서 벼슬한 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78
제5장 아스까산책/96
제2부 백촌강싸움
제1장 김춘추는 무엇을 노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는가/115
제2장 일본은 왜 백촌강에 2만 7천의대군을 보냈는가/125
제3장 국민통합의 총본산 토오다이사/138
제4장 백제의 피를 받았다는 캄무천황은 누구인가/147
제5장 일본은 신라와 어떻게 화해했나/161
제3부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 일본
제1장 쿄오또와 경주/173
제2장 만세일계의 통치자/184
제3장 일본 고대사 산책/218
천황계보도/228
찾아보기/233
제1장 백제왕실과 일본 천황가의 인연/13
제2장 현해탄을 건너서/33
제3장 임나일본부설은 어떻게 생겨났나/50
제4장 백제에서 벼슬한 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78
제5장 아스까산책/96
제2부 백촌강싸움
제1장 김춘추는 무엇을 노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는가/115
제2장 일본은 왜 백촌강에 2만 7천의대군을 보냈는가/125
제3장 국민통합의 총본산 토오다이사/138
제4장 백제의 피를 받았다는 캄무천황은 누구인가/147
제5장 일본은 신라와 어떻게 화해했나/161
제3부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 일본
제1장 쿄오또와 경주/173
제2장 만세일계의 통치자/184
제3장 일본 고대사 산책/218
천황계보도/228
찾아보기/233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