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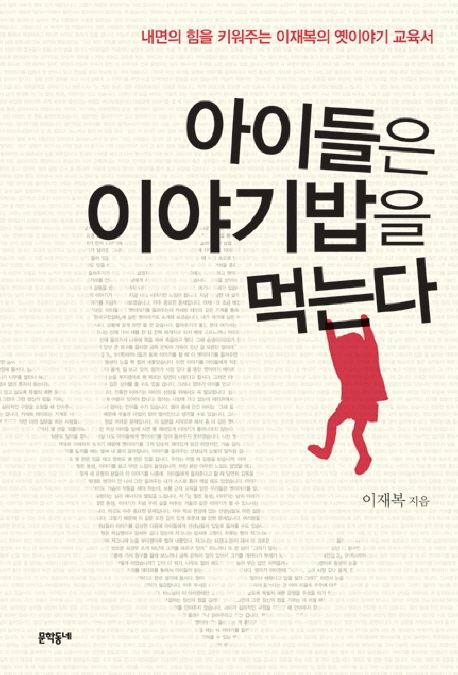
-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이재복의 옛이야기 교육서)
저자 : 이재복
출판사 : 문학동네
출판년 : 2016
ISBN : 9788954611336
책소개
아이들의 정신에 필요한 것은 이야기밥이다!
오랫동안 '밥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온 아동문학사가 이재복의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 이야기를 듣고 읽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문화교육서다. 아이들의 마음밭에 이야기 씨앗을 뿌려주고 싶은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이들의 정신에 영양을 주는 '이야기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옛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바탕이 되는 감성을 다져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해나가도록 인도하는 이야기의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오랫동안 '밥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온 아동문학사가 이재복의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 이야기를 듣고 읽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문화교육서다. 아이들의 마음밭에 이야기 씨앗을 뿌려주고 싶은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이들의 정신에 영양을 주는 '이야기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옛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바탕이 되는 감성을 다져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해나가도록 인도하는 이야기의 능력을 배울 수 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이재복의 옛이야기 교육서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
이야기밥을 먹고 크는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몸에 영양을 주는 밥을 잘 해서 먹여야 합니다. 이 못지않게 정신에 영양을 주는
'이야기밥'도 잘 해서 먹여야 합니다. 옛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를 투사하여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는 밥이 되는 이야기, 삶이 되는 동화를 화두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 온 어린이문학 평론가 이재복이,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듯 써내려간 문학교육서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런데 왜 읽어야 할까,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무엇일까, 아무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않는다.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삶을 직면하는 힘을 키워주는 밥이다. 밥이 없으면 굶어 죽듯이 이야기밥을 먹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속은 황폐해진다. 어린 아이에게 옛이야기를 읽히는 진정한 이유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아이 내면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이야기밥’을 먹이기 위함이다.
이재복은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 읽는다는 것이 아이들 성장에 어떤 밥이 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자고 권한다.
이야기를 ‘듣고 읽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문학교육서
문학 교육은 스스로 자기 삶을 건강하게 꾸려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지금의 수동적, 주입식 책읽기 교육으로는 안 된다. 내면과 소통하는 문학, 삶을 이끌어가는 문학, 즉 밥이 되는 문학이 무엇인지, 부모와 선생님 모두 마음을 모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재복은 동화의 뿌리가 되는 옛이야기에서 해결 단서를 찾아보자 한다. 입말이 살아있는 우리 옛이야기뿐 아니라 일본과 서양의 옛이야기, 여러 단편 동화, 아이들에게 채집한 꿈 이야기, 자신 삶에서 엮어 올린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아이들 교육은 마음속 우주에 피할 수 없이 출몰하는 그림자와 어떻게든 직면해서 싸우고 화해하는 삶을 살게끔, 심리적인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정신 놀이가 되지 않고는 아이들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라나기 힘든 거지요. 그림자 괴물과 어떻게 건강하게 직면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느냐. 이게 바로 옛이야기를 왜 아이들에게 읽혀야 하는가, 그림책을 왜 읽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는 소통의 복합체이다.
이 책에서 이재복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다층적인 구조를 조목조목 집어내고 있다. 아이들은 글을 깨우쳐 스스로 읽기 전, 듣는 문학의 시기 즉 말문학 시기를 거친다. 말문학의 전통은 옛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옛이야기는 이야기꾼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는, 소통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다. 나아가 이야기를 듣고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복합적인 소통 행위이다.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소통이며 관계이다.
들어주는 사람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듣는다는 것은 말문학이 생명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봉사라고, 이재복은 말한다. 옛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순하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도 모르게 남을 위해 들어주는 봉사의 마음을 갖고 자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자식, 선생-학생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아이의 내면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되짚어 보게 된다.
아이들의 꿈을 잘 들어주고 살펴주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꿈은 성장의 시기에 아이들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열정적인 이야기꾼이 되는데, 이때 어른들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아이들과 소통의 물꼬를 열어 두어야 한다. 꿈에서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존재가 있다면, 꿈 대화를 나누며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탈바꿈시켜 주자.
옛이야기는 아이들의 성장과 소통한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 무서운 꿈을 자주 꾸는 것도 그 때문이며, 이야기 속 주인공과 쉽게 동화되는 것도 그 이유다. 옛이야기 주인공은 모험을 떠나고, 기막힌 역경을 만나고, 도움주는 이들을 만나 결국 시련을 극복한다. 아이들은 주인공과 함께 난관을 이겨내며, 자신의 미래에 펼쳐질 어려움들을 정서적으로 체험한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내면의 힘을 다지는 것이다.
이야기에는 항상 주인공을 도와주는 이들이 있다. 이 도움주는 이들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느끼고, 이들의 존재가 무의식에 깊이 자리잡은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시련이 닥쳐도 절대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다.
옛이야기는 내 안의 그림자와의 소통이다.
옛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악인들은 어떤 의미일까. 권선징악의 관점을 넘어서 보자. 이야기 속의 악인은 우리 안의 나쁜 사람이다, 곧 그림자다. 악인을 통해 우리는 자기 안의 부정적인 면(그림자)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기회를 가진다. 내면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만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일이다.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성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재복은 자신의 그림자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가 되고 사유하는 인간으로 성장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괴물들과 놀게 하라.
자신의 내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그 그림자에 먹히지 않고 그림자와 친구가 되어 논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맥스처럼, 괴물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어울려 신나게 논다.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을 놀이로 승화하는 이 건강성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삶에 소중한 자양분이다. 이 놀이정신은 소통의 완결체이며,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다른 이와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할 줄 아는 아이는 감성이 풍부하다. 감성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기초가 된다. 그 소중한 감성 교육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다. 이야기밥 속에 다 있다.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
이야기밥을 먹고 크는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몸에 영양을 주는 밥을 잘 해서 먹여야 합니다. 이 못지않게 정신에 영양을 주는
'이야기밥'도 잘 해서 먹여야 합니다. 옛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를 투사하여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는 밥이 되는 이야기, 삶이 되는 동화를 화두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 온 어린이문학 평론가 이재복이,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듯 써내려간 문학교육서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런데 왜 읽어야 할까,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무엇일까, 아무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않는다.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삶을 직면하는 힘을 키워주는 밥이다. 밥이 없으면 굶어 죽듯이 이야기밥을 먹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속은 황폐해진다. 어린 아이에게 옛이야기를 읽히는 진정한 이유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아이 내면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이야기밥’을 먹이기 위함이다.
이재복은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 읽는다는 것이 아이들 성장에 어떤 밥이 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자고 권한다.
이야기를 ‘듣고 읽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문학교육서
문학 교육은 스스로 자기 삶을 건강하게 꾸려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지금의 수동적, 주입식 책읽기 교육으로는 안 된다. 내면과 소통하는 문학, 삶을 이끌어가는 문학, 즉 밥이 되는 문학이 무엇인지, 부모와 선생님 모두 마음을 모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재복은 동화의 뿌리가 되는 옛이야기에서 해결 단서를 찾아보자 한다. 입말이 살아있는 우리 옛이야기뿐 아니라 일본과 서양의 옛이야기, 여러 단편 동화, 아이들에게 채집한 꿈 이야기, 자신 삶에서 엮어 올린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아이들 교육은 마음속 우주에 피할 수 없이 출몰하는 그림자와 어떻게든 직면해서 싸우고 화해하는 삶을 살게끔, 심리적인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정신 놀이가 되지 않고는 아이들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라나기 힘든 거지요. 그림자 괴물과 어떻게 건강하게 직면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느냐. 이게 바로 옛이야기를 왜 아이들에게 읽혀야 하는가, 그림책을 왜 읽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는 소통의 복합체이다.
이 책에서 이재복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다층적인 구조를 조목조목 집어내고 있다. 아이들은 글을 깨우쳐 스스로 읽기 전, 듣는 문학의 시기 즉 말문학 시기를 거친다. 말문학의 전통은 옛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옛이야기는 이야기꾼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는, 소통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다. 나아가 이야기를 듣고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복합적인 소통 행위이다.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소통이며 관계이다.
들어주는 사람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듣는다는 것은 말문학이 생명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봉사라고, 이재복은 말한다. 옛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순하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도 모르게 남을 위해 들어주는 봉사의 마음을 갖고 자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자식, 선생-학생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아이의 내면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되짚어 보게 된다.
아이들의 꿈을 잘 들어주고 살펴주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꿈은 성장의 시기에 아이들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열정적인 이야기꾼이 되는데, 이때 어른들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아이들과 소통의 물꼬를 열어 두어야 한다. 꿈에서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존재가 있다면, 꿈 대화를 나누며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탈바꿈시켜 주자.
옛이야기는 아이들의 성장과 소통한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 무서운 꿈을 자주 꾸는 것도 그 때문이며, 이야기 속 주인공과 쉽게 동화되는 것도 그 이유다. 옛이야기 주인공은 모험을 떠나고, 기막힌 역경을 만나고, 도움주는 이들을 만나 결국 시련을 극복한다. 아이들은 주인공과 함께 난관을 이겨내며, 자신의 미래에 펼쳐질 어려움들을 정서적으로 체험한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내면의 힘을 다지는 것이다.
이야기에는 항상 주인공을 도와주는 이들이 있다. 이 도움주는 이들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느끼고, 이들의 존재가 무의식에 깊이 자리잡은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시련이 닥쳐도 절대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다.
옛이야기는 내 안의 그림자와의 소통이다.
옛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악인들은 어떤 의미일까. 권선징악의 관점을 넘어서 보자. 이야기 속의 악인은 우리 안의 나쁜 사람이다, 곧 그림자다. 악인을 통해 우리는 자기 안의 부정적인 면(그림자)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기회를 가진다. 내면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만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일이다.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성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재복은 자신의 그림자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가 되고 사유하는 인간으로 성장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괴물들과 놀게 하라.
자신의 내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그 그림자에 먹히지 않고 그림자와 친구가 되어 논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맥스처럼, 괴물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어울려 신나게 논다.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을 놀이로 승화하는 이 건강성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삶에 소중한 자양분이다. 이 놀이정신은 소통의 완결체이며,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다른 이와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할 줄 아는 아이는 감성이 풍부하다. 감성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기초가 된다. 그 소중한 감성 교육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다. 이야기밥 속에 다 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여는 글
1. 들어주는 봉사
2. 잔혹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어야 하는가
3. 옛이야기는 내 몸에서 태어나고 있는 현장의 문학
4. 마음속 우주와 마음 밖 우주
5. 옛이야기 속 고난 극복의 리듬
6.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는 존재
7. 동화 속에서 만난 빛이 되는 정령
8. 옛이야기 속의 전령관
9. 아이들의 몸에 찾아오는 전령관들
10 꿈 놀이를 즐기자
11. 삶에 직면하는 힘을 길러주는 옛이야기
12. 괴물들과 놀게 하라
13. 기르는 엄마, 집어 삼키는 엄마
14. 내 안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마주하기
15. 아이들 몸속에는 꾀쟁이 영웅이 산다.
16. 게으름이 영웅 이야기
닫는 글
1. 들어주는 봉사
2. 잔혹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어야 하는가
3. 옛이야기는 내 몸에서 태어나고 있는 현장의 문학
4. 마음속 우주와 마음 밖 우주
5. 옛이야기 속 고난 극복의 리듬
6.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는 존재
7. 동화 속에서 만난 빛이 되는 정령
8. 옛이야기 속의 전령관
9. 아이들의 몸에 찾아오는 전령관들
10 꿈 놀이를 즐기자
11. 삶에 직면하는 힘을 길러주는 옛이야기
12. 괴물들과 놀게 하라
13. 기르는 엄마, 집어 삼키는 엄마
14. 내 안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마주하기
15. 아이들 몸속에는 꾀쟁이 영웅이 산다.
16. 게으름이 영웅 이야기
닫는 글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