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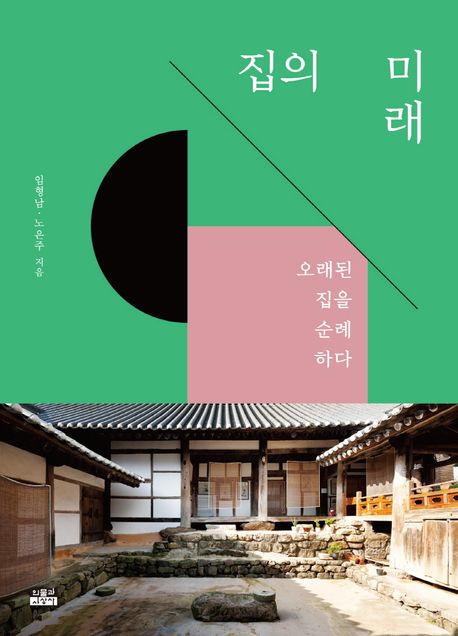
-
집의 미래 (오래된 집을 순례하다)
저자 : 임형남^노은주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출판년 : 2023
ISBN : 9788959067220
책소개
서로를 배려하는 집, ‘김명관 고택’
스승과 제자의 집, ‘임리정과 팔괘정’
우리가 사랑한 옛집을 순례하다
스승과 제자의 집, ‘임리정과 팔괘정’
우리가 사랑한 옛집을 순례하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우리가 사랑한 옛집을 순례하다
“김명관 고택, 선교장, 임리정, 설선당, 남간정사, 소쇄원, 운현궁, 도산서당……”
집은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고, 비를 피하는 껍질이라는 의미 외에도 자기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짓는 이의 생각과 철학을 담는다. 미국 소설가 올리버 웬들 홈스(Oliver Wendell Holmes)는 “우리가 사랑하는 곳은 집이다. 우리의 발은 떠나도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이 집이다”고 말했다. 몸이 떠나도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이 집이다. 집은 단순히 건축물이나 공간을 넘어 생각이 형체를 가지고 우뚝 솟아 있는 유기체와도 같다. 집은 생각으로 짓는 것이고, 모든 집은 의미가 있다. 사람이 각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며 각자의 삶을 사는 것과도 같다.
집은 인간이 짓지만 시간이 완성시킨다.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이다. 시간은 어떤 건물이든 장점을 만들어내고 단점을 덮어주고 아름답게 다듬어준다. 시간을 품고 있는 건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단순한 물성에 대한 감성에 더해 우리에게 시간의 흔적이 주는 감성이 보태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시간이 만든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외면한 채 지우기도 한다. 그렇게 집은 우주의 호흡처럼 크고 우렁차지만 시간이 켜켜이 쌓인 삶의 숨결을 오롯이 들려준다. 지금 우리의 옛집을 만나는 일은 과거의 시간을 만나는 일이자, 집의 미래를 기억하는 일이기도 하다.
호남평야의 평온한 조화를 닮은 김명관 고택은 서로를 배려하는 집이다. 집의 모든 공간은 이야기가 흘러가듯 서로 조금씩 간섭을 하면서 흘러간다. 강릉에 있는 오래된 부잣집인 선교장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집이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가장 핵심의 단위인 가족을 중심으로 삼고자 했던 이내번의 철학이 담겨 있다. 남간정사는 송시열이 평생의 학문을 정리해서 지어놓은 집이며, 작고 소박한 듯하면서 자연의 온갖 아름다움을 세세히 담아낸 집이다. 종묘는 영혼이 사는 집이고 신이 사는 집이다. 인간의 척도가 아닌 신의 척도로 지어진 그 수평적 무한성과 공간감은 우리의 감각을 넘어선다.
임형남ㆍ노은주의 『집의 미래』에는 우리가 사랑한 오래된 집들을 순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삶이 담긴 살림집과 자연에 스며들어 또다른 자연이 된 사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옛집 32군데를 순례하면서 미래의 집을 생각한다. 그 오래된 집들은 정지해 있어도 무척 강한 움직임이 있고, 경계를 넘나들며 독특한 경지를 이룬 우리의 문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제1부는 한국의 옛집을 순례한다. 산천재, 선교장, 임리정, 소수서원, 남간정사, 경복궁 등 우리의 옛집 15군데를 둘러본다. 제2부는 한국의 사찰을 순례한다. 화엄사, 통도사, 선운사, 실상사, 황룡사지, 미륵사지 등 우리의 사찰 17군데를 둘러본다.
산과 하늘처럼 변하지 않는 집
지리산 천왕봉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남명 조식(曺植)의 집인 산천재가 있다. ‘산속에 하늘이 담긴 집’이라는 뜻인 산천재는 조식이 61세에 짓고 인생의 말년을 보낸 집이다.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처사로 살았던 조식은 학문적인 깊이와 높이를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대학자였다. 그는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밤에도 정신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었다. 명종이 그를 단성 현감에 임명하자, 사직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산천재는 그런 조식을 무척 닮았다. 절묘한 공간의 구성도 없고 아름다운 건물의 집합도 없고 우리의 옛집이 보여주는 다양한 마당조차 없다. 고수의 한 획처럼 지리산과 덕천강 사이에 한 점을 찍어놓은 것 같다. 세상의 이런저런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산과 하늘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자 했던 진정한 처사의 집이다.
김명관 고택은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라는 곳에 있는 집이다. 이 집은 따로 전해지는 당호는 없고, 김명관(金命寬)이 지은 집이라는 사실과 지은 지 약 240년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진다. 김명관 고택은 칸수로 100여 칸이었고, 동수로는 7동, 영역으로 구분하자면 다섯 개의 영역이 있을 정도로 보통 큰 집이 아니었다. 김명관 고택은 전형적인 호남 부잣집의 모양대로 여러 개의 건물이 자유롭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 공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특히 안채의 시어머니 영역과 며느리 영역은 부엌과 방의 모양, 그 상부의 다락 등이 그림을 그리고 반을 접어 똑같이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 이는 권력은 넘겨주지 않아도 실질적인 권한은 동등하게 가지고 나간다는 인간적인 배려를 통해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간 것이다. 그래서 고부간에 서로 일정한 거리와 영역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임리정은 우리나라 예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김장생(金長生)이 추구하는 삶과 닮은 집이다. 팔괘정은 김장생의 제자인 송시열(宋時烈)이 자신의 집을 우주 만물이 함축된 중심으로 보고 지은 집이다. 임리정은 ‘깊은 못가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얇은 얼음장을 밟는 것과 같이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는 김장생이 평생 가슴에 품고 행동에 드리어 놓았던 인생의 지침이었던 ‘경(敬)’을 의미한다. 더욱이 임리정은 두드러지게 불끈 솟지도 않고 남들이 쉽게 내려다보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다. 그 집은 3칸 집, 가장 평범하지만 모든 선비가 마지막에 돌아간다는 ‘삼간지제(三間之制)’에 따른 집이다. 즉, 밖으로는 온화하지만 안으로는 뜻이 높은 김장생이 추구하는 삶을 닮았다. 팔괘정이 임리정과 불과 1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송시열이 스승인 김장생 가까이에 있고자 한 마음을 담은 것이다.
그림자가 쉬는 집
식영정은 김성원(金成遠)이 그의 장인이며 스승인 임억령(林億齡)을 위해 지은 집이다. 식영정이라는 이름은 ‘그림자가 쉬는 정자’라는 뜻이다. 임억령은 그림자를 ‘사람을 얽어매는 욕망이며 현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식영정은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그림자를 끊겠다는 의미의 집이다.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잠시 거두고, ‘홍진에 묻힌’ 사람들이 현실과 거리를 두는 곳이다. 식영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아주 작은 집이다. 높은 언덕에 있지만,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이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절묘하게 한 발 물러나서 밖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정자로서 얻어야 하는 차경(借景)은 충분히 얻으며 겸손하게 자리할 수 있었다.
도산서원은 이황(李滉)이 57세 되던 해에 짓기 시작해 60세에 완성했다는 도산서당 일원에서 시작한다. 도산서당은 이황이 공부하는 공간과 제자를 가르치는 공간, 그 사이에 수많은 책을 쌓아놓은 서가 공간과 부엌 공간으로 이루어진 4.5칸이라는 모호한 크기의 집이다. 이황은 항상 몸과 마음을 삼가며 바르게 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바른 지식을 얻고자 했다. 즉, 그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 늘 겸손하고 삼가는 자세로 임하는 성실성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삼았다. 그래서인지 도산서당은 작지만 겸손하고 조용하며 경건하다. 여느 서원 건축과는 다른 자유로운 공간적 융통성이 드러나는 도산서원은 당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다. 이황의 학문에 대한 자세와 제자를 대하는 방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정궁(正宮)이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며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뒤로는 백악산을 베고 누워, 오른쪽에는 인왕산을, 왼쪽에는 낙산을, 발치에는 남산과 관악산을 두고 정남향으로 지은 궁궐이다. 그 경복궁 안에 자경전이 있다. 자경전은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왕위 계승자로 삼고 그의 양어머니가 된 신정왕후(조대비)를 위해 지어준 집이다. 누마루가 하나 덩실 떠 있고 양편으로 기단을 높이 쌓고 건물을 세운 아주 단정하고 품위 있는 집이다. 자경전은 강녕전이나 교태전 등 정식 침전과 달리 좀더 한가롭고 편안한 침전인 연침(燕寢), 즉 가정집 분위기의 침전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자경전 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마당 조경에서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은 집안이 곤궁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일제는 슬그머니 그런 정도의 어깃장이라도 놓아야 직성이 풀리고 불안감이 사라졌나 보다.
살아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집
대웅전은 석가모니의 집이고 무량수전이나 극락전은 아미타불의 집이다. 관음전은 관세음보살의 집이며 미륵전이나 용화전은 미륵보살의 집이다. 대적광전이나 비로전은 비로자나불의 집이다. 그런데 화엄사에는 석가모니의 집만 두 채가 있다. 비로자나불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각황전에 석가모니가, 석가모니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웅전에는 비로자나불이 앉아 있다. 이는 모든 것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연결되는 화엄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불교적 도상(圖像)이 아닐까? 아니면 경계가 없이 두루 회통하는 화엄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한 것일까? 서로 다른 질서들이 직교하고 교차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우면서 엄정한 화엄사의 공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모양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결국 상(相)은 상이 아니고, 존재가 없음을 알게 될 때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금강경』에서 석가모니가 여러 차례 강조한 이야기다. 그 핵심에는 ‘부재’가 존재한다. 부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패러독스다. 통도사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강력한 존재를 보여주는 곳이다. 통도사 대웅전에는 석가모니가 없다. 마땅히 있어야 할 대웅전 대좌에는 빈 방석이 하나 놓여 있다. 그것은 통도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한 탑이 부처님의 방석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다. 부처가 항상 그곳에 있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웅전에 불상을 모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소사 설선당은 대웅보전 옆에 있는데,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사채이자 그들이 모여 공부하고 정진하는 곳이다. 요사는 절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지만, 수행 공간으로서 그 특성상 공개되거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아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공간이다. 설선당은 ㅁ자형 평면의 집인데, 절에 있는 전각이라기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살림집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그런데 설선당은 네모반듯한 안마당을 중심으로 집의 사면이 서로 맞물리며 반 층씩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담을 쌓고 축대를 높여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명확하고 굵은 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건축을 태워놓은 것이다. 경사지에 집을 지으며 땅을 긁어내거나 덧쌓지 않고 지형에 순응하며 지형의 흐름대로 집을 앉힌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과 건축은 섞여 들어가며 각각의 존재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 중첩하게 된다.
폐사지는 예전에 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빈터만 남은 곳을 말한다. 대표적인 폐사지는 경주 황룡사지, 강릉 굴산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이 있다. 폐사지에는 간혹 불완전하게나마 석탑, 불상, 석등 같은 유물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라진 빈 곳을 채우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이 망한 곳에서 건축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역설적인 장소다. 또 없음으로써 강력한 존재의 의미를 새기는 것, 그런 역설의 미학이 바로 폐허의 미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켜켜이 퇴적되어 있고 기억이 바닥에 질펀하게 깔린 폐사지에서 아주 특별한 공감각적인 체험을 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인식 능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며 주초(柱礎)만 남은 자리에 기둥을 복원하고, 그 위에 지붕을 올려 완성한다. 건축을 감상하는 대신 창조적인 수용으로 스스로 건축을 하게 된다.
“김명관 고택, 선교장, 임리정, 설선당, 남간정사, 소쇄원, 운현궁, 도산서당……”
집은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고, 비를 피하는 껍질이라는 의미 외에도 자기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짓는 이의 생각과 철학을 담는다. 미국 소설가 올리버 웬들 홈스(Oliver Wendell Holmes)는 “우리가 사랑하는 곳은 집이다. 우리의 발은 떠나도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이 집이다”고 말했다. 몸이 떠나도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이 집이다. 집은 단순히 건축물이나 공간을 넘어 생각이 형체를 가지고 우뚝 솟아 있는 유기체와도 같다. 집은 생각으로 짓는 것이고, 모든 집은 의미가 있다. 사람이 각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며 각자의 삶을 사는 것과도 같다.
집은 인간이 짓지만 시간이 완성시킨다.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이다. 시간은 어떤 건물이든 장점을 만들어내고 단점을 덮어주고 아름답게 다듬어준다. 시간을 품고 있는 건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단순한 물성에 대한 감성에 더해 우리에게 시간의 흔적이 주는 감성이 보태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시간이 만든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외면한 채 지우기도 한다. 그렇게 집은 우주의 호흡처럼 크고 우렁차지만 시간이 켜켜이 쌓인 삶의 숨결을 오롯이 들려준다. 지금 우리의 옛집을 만나는 일은 과거의 시간을 만나는 일이자, 집의 미래를 기억하는 일이기도 하다.
호남평야의 평온한 조화를 닮은 김명관 고택은 서로를 배려하는 집이다. 집의 모든 공간은 이야기가 흘러가듯 서로 조금씩 간섭을 하면서 흘러간다. 강릉에 있는 오래된 부잣집인 선교장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집이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가장 핵심의 단위인 가족을 중심으로 삼고자 했던 이내번의 철학이 담겨 있다. 남간정사는 송시열이 평생의 학문을 정리해서 지어놓은 집이며, 작고 소박한 듯하면서 자연의 온갖 아름다움을 세세히 담아낸 집이다. 종묘는 영혼이 사는 집이고 신이 사는 집이다. 인간의 척도가 아닌 신의 척도로 지어진 그 수평적 무한성과 공간감은 우리의 감각을 넘어선다.
임형남ㆍ노은주의 『집의 미래』에는 우리가 사랑한 오래된 집들을 순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삶이 담긴 살림집과 자연에 스며들어 또다른 자연이 된 사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옛집 32군데를 순례하면서 미래의 집을 생각한다. 그 오래된 집들은 정지해 있어도 무척 강한 움직임이 있고, 경계를 넘나들며 독특한 경지를 이룬 우리의 문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제1부는 한국의 옛집을 순례한다. 산천재, 선교장, 임리정, 소수서원, 남간정사, 경복궁 등 우리의 옛집 15군데를 둘러본다. 제2부는 한국의 사찰을 순례한다. 화엄사, 통도사, 선운사, 실상사, 황룡사지, 미륵사지 등 우리의 사찰 17군데를 둘러본다.
산과 하늘처럼 변하지 않는 집
지리산 천왕봉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남명 조식(曺植)의 집인 산천재가 있다. ‘산속에 하늘이 담긴 집’이라는 뜻인 산천재는 조식이 61세에 짓고 인생의 말년을 보낸 집이다.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처사로 살았던 조식은 학문적인 깊이와 높이를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대학자였다. 그는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밤에도 정신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었다. 명종이 그를 단성 현감에 임명하자, 사직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산천재는 그런 조식을 무척 닮았다. 절묘한 공간의 구성도 없고 아름다운 건물의 집합도 없고 우리의 옛집이 보여주는 다양한 마당조차 없다. 고수의 한 획처럼 지리산과 덕천강 사이에 한 점을 찍어놓은 것 같다. 세상의 이런저런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산과 하늘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자 했던 진정한 처사의 집이다.
김명관 고택은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라는 곳에 있는 집이다. 이 집은 따로 전해지는 당호는 없고, 김명관(金命寬)이 지은 집이라는 사실과 지은 지 약 240년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진다. 김명관 고택은 칸수로 100여 칸이었고, 동수로는 7동, 영역으로 구분하자면 다섯 개의 영역이 있을 정도로 보통 큰 집이 아니었다. 김명관 고택은 전형적인 호남 부잣집의 모양대로 여러 개의 건물이 자유롭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 공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특히 안채의 시어머니 영역과 며느리 영역은 부엌과 방의 모양, 그 상부의 다락 등이 그림을 그리고 반을 접어 똑같이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 이는 권력은 넘겨주지 않아도 실질적인 권한은 동등하게 가지고 나간다는 인간적인 배려를 통해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간 것이다. 그래서 고부간에 서로 일정한 거리와 영역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임리정은 우리나라 예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김장생(金長生)이 추구하는 삶과 닮은 집이다. 팔괘정은 김장생의 제자인 송시열(宋時烈)이 자신의 집을 우주 만물이 함축된 중심으로 보고 지은 집이다. 임리정은 ‘깊은 못가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얇은 얼음장을 밟는 것과 같이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는 김장생이 평생 가슴에 품고 행동에 드리어 놓았던 인생의 지침이었던 ‘경(敬)’을 의미한다. 더욱이 임리정은 두드러지게 불끈 솟지도 않고 남들이 쉽게 내려다보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다. 그 집은 3칸 집, 가장 평범하지만 모든 선비가 마지막에 돌아간다는 ‘삼간지제(三間之制)’에 따른 집이다. 즉, 밖으로는 온화하지만 안으로는 뜻이 높은 김장생이 추구하는 삶을 닮았다. 팔괘정이 임리정과 불과 1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송시열이 스승인 김장생 가까이에 있고자 한 마음을 담은 것이다.
그림자가 쉬는 집
식영정은 김성원(金成遠)이 그의 장인이며 스승인 임억령(林億齡)을 위해 지은 집이다. 식영정이라는 이름은 ‘그림자가 쉬는 정자’라는 뜻이다. 임억령은 그림자를 ‘사람을 얽어매는 욕망이며 현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식영정은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그림자를 끊겠다는 의미의 집이다.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잠시 거두고, ‘홍진에 묻힌’ 사람들이 현실과 거리를 두는 곳이다. 식영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아주 작은 집이다. 높은 언덕에 있지만,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이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절묘하게 한 발 물러나서 밖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정자로서 얻어야 하는 차경(借景)은 충분히 얻으며 겸손하게 자리할 수 있었다.
도산서원은 이황(李滉)이 57세 되던 해에 짓기 시작해 60세에 완성했다는 도산서당 일원에서 시작한다. 도산서당은 이황이 공부하는 공간과 제자를 가르치는 공간, 그 사이에 수많은 책을 쌓아놓은 서가 공간과 부엌 공간으로 이루어진 4.5칸이라는 모호한 크기의 집이다. 이황은 항상 몸과 마음을 삼가며 바르게 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바른 지식을 얻고자 했다. 즉, 그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 늘 겸손하고 삼가는 자세로 임하는 성실성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삼았다. 그래서인지 도산서당은 작지만 겸손하고 조용하며 경건하다. 여느 서원 건축과는 다른 자유로운 공간적 융통성이 드러나는 도산서원은 당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다. 이황의 학문에 대한 자세와 제자를 대하는 방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정궁(正宮)이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며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뒤로는 백악산을 베고 누워, 오른쪽에는 인왕산을, 왼쪽에는 낙산을, 발치에는 남산과 관악산을 두고 정남향으로 지은 궁궐이다. 그 경복궁 안에 자경전이 있다. 자경전은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왕위 계승자로 삼고 그의 양어머니가 된 신정왕후(조대비)를 위해 지어준 집이다. 누마루가 하나 덩실 떠 있고 양편으로 기단을 높이 쌓고 건물을 세운 아주 단정하고 품위 있는 집이다. 자경전은 강녕전이나 교태전 등 정식 침전과 달리 좀더 한가롭고 편안한 침전인 연침(燕寢), 즉 가정집 분위기의 침전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자경전 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마당 조경에서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은 집안이 곤궁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일제는 슬그머니 그런 정도의 어깃장이라도 놓아야 직성이 풀리고 불안감이 사라졌나 보다.
살아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집
대웅전은 석가모니의 집이고 무량수전이나 극락전은 아미타불의 집이다. 관음전은 관세음보살의 집이며 미륵전이나 용화전은 미륵보살의 집이다. 대적광전이나 비로전은 비로자나불의 집이다. 그런데 화엄사에는 석가모니의 집만 두 채가 있다. 비로자나불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각황전에 석가모니가, 석가모니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웅전에는 비로자나불이 앉아 있다. 이는 모든 것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연결되는 화엄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불교적 도상(圖像)이 아닐까? 아니면 경계가 없이 두루 회통하는 화엄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한 것일까? 서로 다른 질서들이 직교하고 교차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우면서 엄정한 화엄사의 공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모양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결국 상(相)은 상이 아니고, 존재가 없음을 알게 될 때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금강경』에서 석가모니가 여러 차례 강조한 이야기다. 그 핵심에는 ‘부재’가 존재한다. 부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패러독스다. 통도사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강력한 존재를 보여주는 곳이다. 통도사 대웅전에는 석가모니가 없다. 마땅히 있어야 할 대웅전 대좌에는 빈 방석이 하나 놓여 있다. 그것은 통도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한 탑이 부처님의 방석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다. 부처가 항상 그곳에 있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웅전에 불상을 모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소사 설선당은 대웅보전 옆에 있는데,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사채이자 그들이 모여 공부하고 정진하는 곳이다. 요사는 절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지만, 수행 공간으로서 그 특성상 공개되거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아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공간이다. 설선당은 ㅁ자형 평면의 집인데, 절에 있는 전각이라기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살림집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그런데 설선당은 네모반듯한 안마당을 중심으로 집의 사면이 서로 맞물리며 반 층씩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담을 쌓고 축대를 높여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명확하고 굵은 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건축을 태워놓은 것이다. 경사지에 집을 지으며 땅을 긁어내거나 덧쌓지 않고 지형에 순응하며 지형의 흐름대로 집을 앉힌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과 건축은 섞여 들어가며 각각의 존재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 중첩하게 된다.
폐사지는 예전에 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빈터만 남은 곳을 말한다. 대표적인 폐사지는 경주 황룡사지, 강릉 굴산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이 있다. 폐사지에는 간혹 불완전하게나마 석탑, 불상, 석등 같은 유물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라진 빈 곳을 채우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이 망한 곳에서 건축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역설적인 장소다. 또 없음으로써 강력한 존재의 의미를 새기는 것, 그런 역설의 미학이 바로 폐허의 미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켜켜이 퇴적되어 있고 기억이 바닥에 질펀하게 깔린 폐사지에서 아주 특별한 공감각적인 체험을 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인식 능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며 주초(柱礎)만 남은 자리에 기둥을 복원하고, 그 위에 지붕을 올려 완성한다. 건축을 감상하는 대신 창조적인 수용으로 스스로 건축을 하게 된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책머리에 ㆍ 7
제1부 한국의 옛집
제1장 이야기를 담다
산과 하늘처럼 변하지 않는 집 : 산천재
마음으로 도를 깨닫다 ㆍ 19 제일 큰 집이자 좋은 집 ㆍ 23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다 ㆍ 27
세상의 중심이 되는 집 : 선교장
위계가 없고 기능도 없다 ㆍ 31 모든 땅이 명당이다 ㆍ 34 진정한 의미의 대가족을 이루다 ㆍ 39
서로를 배려하는 집 : 김명관 고택
호남의 풍족한 들판을 닮다 ㆍ 43 다양한 공간의 조화로운 구성 ㆍ 46 시어머니 영역과 며느리 영역의 균형감 ㆍ 52
권력의 상징이 된 집 : 운현궁
야심가이자 영리한 정치가 ㆍ 56 몰락해간 조선의 두 주인공 ㆍ 60 집이지만 집이 아닌 곳 ㆍ 63
제2장 생각을 이어가다
스승과 제자의 집 : 임리정과 팔괘정
꽃이 피고 지듯 사람도 피고 지다 ㆍ 69 시대를 설계하고 시공하다 ㆍ 72 예학자의 삶을 담다 ㆍ 76
존중하며 공부하는 집 : 소수서원
학교와 군대와 감옥은 같다 ㆍ 81 성리학을 잇고 후학을 양성하다 ㆍ 84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 ㆍ 88
반듯하고 삼가는 집 :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선비처럼 반듯하고 엄격하다 ㆍ 93 몸과 마음을 삼가다 ㆍ 97 인간으로서 완성되어가는 과정 ㆍ 101
유쾌하고 인간적인 집 : 도동서원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국가 ㆍ 104 성리학적인 이상세계를 꿈꾸다 ㆍ 108 아주 정연한 좌우 대칭의 공간 ㆍ 111
제3장 조화를 이루다
물 위에 앉은 집 : 남간정사
고집스럽고 타협을 모르는 정치가 ㆍ 117 만화경 같은 세상의 풍경 ㆍ 121 자연과 집의 조화 ㆍ 125
그림자가 쉬는 집 : 소쇄원과 식영정
아름다운 풍경과 문학적 향기를 담다 ㆍ 129 시작과 끝의 존재적 순환 ㆍ 132 한 발 물러서 있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 ㆍ 136
감각을 뛰어넘는 집 : 종묘
움직이는 것도,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닌 ㆍ 141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각 ㆍ 145 모든 소리와 생각을 압도하다 ㆍ 148
왕이 사는 집 : 경복궁
국가의 상징인 궁궐 ㆍ 153 단정하고 품위 있는 집 ㆍ 156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 ㆍ 160
제2부 한국의 사찰
제1장 처음으로 돌아가다
그물같이 긴밀하게 상생하다 : 화엄사
서로 어울리는 경지 ㆍ 167 수많은 절을 품은 지리산 ㆍ 171 모든 것의 경계가 사라지다 ㆍ 175
없음으로 가득한 존재 : 통도사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ㆍ 179 모든 형상은 모양이 없다 ㆍ 184 석가모니도 없고 미륵불도 없다 ㆍ 186
티끌에도 세계가 있다 : 해인사
모든 것이 곧 하나다 ㆍ 191 스님들의 기상이 넘치는 예불 ㆍ 194 화엄의 정신이 깃들다 ㆍ 197
부처의 세상을 함께 만들다 : 부석사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ㆍ 202 천상의 소리처럼 황홀하다 ㆍ 206 성과 속이 함께 있다 ㆍ 209
제2장 미래를 보다
존재하는 것은 순환한다 : 내소사
시작이 끝이 되다 ㆍ 215 모든 차원이 서로 물려 있다 ㆍ 219 맞물리는 공간의 구조 ㆍ 221
살아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다 : 선운사
4월의 동백꽃을 보러 갔다 ㆍ 226 금강석처럼 견고하고 자유롭다 ㆍ 229 중생의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로 ㆍ 233
모든 것을 품어주다 : 실상사
어머니 같은 깊은 산 ㆍ 238 천왕봉은 쉽게 만날 수 없다 ㆍ 242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ㆍ 245
창조의 영감을 얻다 : 무위사
바람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ㆍ 250 진리의 전당에 들어서다 ㆍ 253 여행을 통해 배우는 건축 ㆍ 257
제3장 경계를 넘나들다
그곳에 깨달음이 있다 : 기원정사와 황룡사지
비틀스와 동양의 정신 ㆍ 263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ㆍ 268 비어 있음으로 가득 차다 ㆍ 271
사라진 것을 기억하다 : 진전사지와 대동사지
폐허가 들려주는 이야기 ㆍ 275 크게 비어 있다 ㆍ 279 천년을 비추는 빛 ㆍ 282
인간이 짓고 시간이 완성하다 : 거돈사지와 흥법사지와 법천사지
아름다운 시간의 흔적 ㆍ 286 도시의 풍경을 구경하는 여행 ㆍ 290 시간의 성찬을 즐기다 ㆍ 293
영원한 현재를 살다 : 미륵사지와 굴산사지
시간은 흘러간다 ㆍ 297 시간을 지워버리다 ㆍ 301 과거를 더듬는 시간의 문 ㆍ 304
주 ㆍ 308
제1부 한국의 옛집
제1장 이야기를 담다
산과 하늘처럼 변하지 않는 집 : 산천재
마음으로 도를 깨닫다 ㆍ 19 제일 큰 집이자 좋은 집 ㆍ 23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다 ㆍ 27
세상의 중심이 되는 집 : 선교장
위계가 없고 기능도 없다 ㆍ 31 모든 땅이 명당이다 ㆍ 34 진정한 의미의 대가족을 이루다 ㆍ 39
서로를 배려하는 집 : 김명관 고택
호남의 풍족한 들판을 닮다 ㆍ 43 다양한 공간의 조화로운 구성 ㆍ 46 시어머니 영역과 며느리 영역의 균형감 ㆍ 52
권력의 상징이 된 집 : 운현궁
야심가이자 영리한 정치가 ㆍ 56 몰락해간 조선의 두 주인공 ㆍ 60 집이지만 집이 아닌 곳 ㆍ 63
제2장 생각을 이어가다
스승과 제자의 집 : 임리정과 팔괘정
꽃이 피고 지듯 사람도 피고 지다 ㆍ 69 시대를 설계하고 시공하다 ㆍ 72 예학자의 삶을 담다 ㆍ 76
존중하며 공부하는 집 : 소수서원
학교와 군대와 감옥은 같다 ㆍ 81 성리학을 잇고 후학을 양성하다 ㆍ 84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 ㆍ 88
반듯하고 삼가는 집 :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선비처럼 반듯하고 엄격하다 ㆍ 93 몸과 마음을 삼가다 ㆍ 97 인간으로서 완성되어가는 과정 ㆍ 101
유쾌하고 인간적인 집 : 도동서원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국가 ㆍ 104 성리학적인 이상세계를 꿈꾸다 ㆍ 108 아주 정연한 좌우 대칭의 공간 ㆍ 111
제3장 조화를 이루다
물 위에 앉은 집 : 남간정사
고집스럽고 타협을 모르는 정치가 ㆍ 117 만화경 같은 세상의 풍경 ㆍ 121 자연과 집의 조화 ㆍ 125
그림자가 쉬는 집 : 소쇄원과 식영정
아름다운 풍경과 문학적 향기를 담다 ㆍ 129 시작과 끝의 존재적 순환 ㆍ 132 한 발 물러서 있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 ㆍ 136
감각을 뛰어넘는 집 : 종묘
움직이는 것도,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닌 ㆍ 141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각 ㆍ 145 모든 소리와 생각을 압도하다 ㆍ 148
왕이 사는 집 : 경복궁
국가의 상징인 궁궐 ㆍ 153 단정하고 품위 있는 집 ㆍ 156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 ㆍ 160
제2부 한국의 사찰
제1장 처음으로 돌아가다
그물같이 긴밀하게 상생하다 : 화엄사
서로 어울리는 경지 ㆍ 167 수많은 절을 품은 지리산 ㆍ 171 모든 것의 경계가 사라지다 ㆍ 175
없음으로 가득한 존재 : 통도사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ㆍ 179 모든 형상은 모양이 없다 ㆍ 184 석가모니도 없고 미륵불도 없다 ㆍ 186
티끌에도 세계가 있다 : 해인사
모든 것이 곧 하나다 ㆍ 191 스님들의 기상이 넘치는 예불 ㆍ 194 화엄의 정신이 깃들다 ㆍ 197
부처의 세상을 함께 만들다 : 부석사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ㆍ 202 천상의 소리처럼 황홀하다 ㆍ 206 성과 속이 함께 있다 ㆍ 209
제2장 미래를 보다
존재하는 것은 순환한다 : 내소사
시작이 끝이 되다 ㆍ 215 모든 차원이 서로 물려 있다 ㆍ 219 맞물리는 공간의 구조 ㆍ 221
살아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다 : 선운사
4월의 동백꽃을 보러 갔다 ㆍ 226 금강석처럼 견고하고 자유롭다 ㆍ 229 중생의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로 ㆍ 233
모든 것을 품어주다 : 실상사
어머니 같은 깊은 산 ㆍ 238 천왕봉은 쉽게 만날 수 없다 ㆍ 242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ㆍ 245
창조의 영감을 얻다 : 무위사
바람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ㆍ 250 진리의 전당에 들어서다 ㆍ 253 여행을 통해 배우는 건축 ㆍ 257
제3장 경계를 넘나들다
그곳에 깨달음이 있다 : 기원정사와 황룡사지
비틀스와 동양의 정신 ㆍ 263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ㆍ 268 비어 있음으로 가득 차다 ㆍ 271
사라진 것을 기억하다 : 진전사지와 대동사지
폐허가 들려주는 이야기 ㆍ 275 크게 비어 있다 ㆍ 279 천년을 비추는 빛 ㆍ 282
인간이 짓고 시간이 완성하다 : 거돈사지와 흥법사지와 법천사지
아름다운 시간의 흔적 ㆍ 286 도시의 풍경을 구경하는 여행 ㆍ 290 시간의 성찬을 즐기다 ㆍ 293
영원한 현재를 살다 : 미륵사지와 굴산사지
시간은 흘러간다 ㆍ 297 시간을 지워버리다 ㆍ 301 과거를 더듬는 시간의 문 ㆍ 304
주 ㆍ 308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