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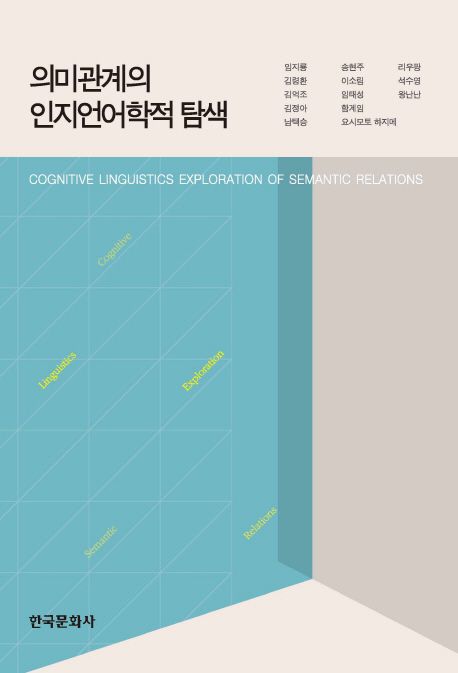
-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저자 : 임지룡^김령환^김억조^김정아^남택승
출판사 : 한국문화사
출판년 : 2017
ISBN : 9788968175152
책소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미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의미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재해석하고, 말뭉치를 활용한 용법기반 모형에 따라 의미관계의 빈도, 의미적 선호 및 관습성을 밝히며, 심리언어학적 실험 기법으로 이론 탐구를 뒷받침하는 등 역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의미관계’에 대해 탐색하였고, 그 결실을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에 담았다.
이 책은 총 4부, 1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는 의미관계의 이해와 연구를 위한 길잡이로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지형도를 실었다. 제2부는 의미관계의 국어학적 탐색으로, 유의어 ‘사람’과 ‘인간’의 사용 양상, ‘살다’와 ‘죽다’의 대립성 해석, 다의어의 의미 구조와 의미 확장 양상, 관용표현의 유의관계와 대립관계로 구성된다. 제3부는 의미관계의 교육학적 탐색으로, 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국어 반의어 교육 내용 제안,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이해, 한국어 연결어미 ‘-(으)ㄴ/는데’의 유의성으로 구성된다. 제4부는 의미관계의 대조언어학적 탐색으로, 한·일어 의미관계 대조, ‘밝다’와 ‘환하다’의 유의관계, 다의어에 나타난 대립관계와 해석, 한국어 ‘죽다’와 중국어 ‘死’의 다의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총 4부, 1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는 의미관계의 이해와 연구를 위한 길잡이로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지형도를 실었다. 제2부는 의미관계의 국어학적 탐색으로, 유의어 ‘사람’과 ‘인간’의 사용 양상, ‘살다’와 ‘죽다’의 대립성 해석, 다의어의 의미 구조와 의미 확장 양상, 관용표현의 유의관계와 대립관계로 구성된다. 제3부는 의미관계의 교육학적 탐색으로, 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국어 반의어 교육 내용 제안,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이해, 한국어 연결어미 ‘-(으)ㄴ/는데’의 유의성으로 구성된다. 제4부는 의미관계의 대조언어학적 탐색으로, 한·일어 의미관계 대조, ‘밝다’와 ‘환하다’의 유의관계, 다의어에 나타난 대립관계와 해석, 한국어 ‘죽다’와 중국어 ‘死’의 다의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책 속으로 추가]
제1부ㆍ의미관계의 이해와 연구
제1장 /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지형도
1. 들머리
이 글의 목적은 의미 연구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밝히고,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의 바탕 위에서 탐구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지형도를 그리는 데 있다. ‘의미관계(meaning relation)’가 갖는 의의는 관계를 통해 어떤 단어가 의미나 개념적으로 다른 단어와 관련을 맺으면서 그 위상과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의미관계는 구조주의적 의미 연구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으면서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중 의미의 계열관계는 어휘소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이며, 결합관계는 어휘소가 횡적으로 맺는 관계이다. 이 관점에서는 의미관계를 포착함으로써 (추상적인) 의미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 표현의 의미를 의미관계 속에서 다른 표현들과 맺는 관계의 합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이라고 하는데(Cruse 2000: 96-102, 2001: 242-244 참조), 단어의 의미란 해당 언어의 모든 다른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발상이다. 이처럼 구조의미론에서는 ‘의의(sense)’란 독립적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동일한 체계 속의 대조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의미관계에 대한 구조의미론은 언어의 의미관계를 계열적 관계와 결합적 관계를 통해 어휘 의미의 구조 또는 체계의 수립과 이해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 관점은 의미를 언어 자체의 관계적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므로 의미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의미 구조는 엄격한 언어 내적 관계들의 방대한 연산이 되는 것으로, 화자들이 이 세상을 개념화하는 방식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의미관계는 인지언어학의 주된 관심 분야가 되지 못하였으며, 그 성과도 제한되어 있다. 인지적 경향은 어휘 의미 연구의 여러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Croft & Cruse(2004: 141)의 언급처럼 “인지언어학자들은 대체로 의의관계에 대해 말할 것이 거의 없었다(Cognitive linguistics, for the most part, have had very little to say on the topic.).” 의미관계에 대한 인지언어학 이전과 이후를 가늠할 경우, 인지적 접근을 통해 의미관계에 새로운 빛을 비춘 시도는 Croft & Cruse(2004: 141)의 “의의관계란 단어들 자체 간의 의미관계가 아니라, 단어들의 특별한 문맥적 해석 간의 의미관계로 간주x된다.”라는 언급을 통해서이다. 이것은 의미관계가 한층 더 유연하고 역동적인 관계임을 뜻한다. 의미관계에 대한 구조의미론의 ‘언어 자체의 내적 의미관계’에 대한 탐구에서 인지언어학의 ‘문맥과 상황에서 역동적인 해석 간의 의미관계’에 대한 탐구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의미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의미관계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려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의미관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계열관계와 결합관계의 주요 연구 내용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방법론
여기서는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주요 방법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1. 원형 범주화
구조주의를 비롯한 객관주의 또는 자율언어학에서는 의미의 구조나 작용 방식을 대칭적, 평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 중심적 관점(logocentric view)’으로 ‘고전 범주화(classical categorization)’의 세계관에 뿌리를 둔 것인데, 범주는 필요 충분한 특정 자질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등가적이며, 범주의 경계는 명확하다고 본다.
그 반면, 인지언어학은 ‘인간 중심적 관점(anthropocentric view)’으로 ‘원형 범주화(prototypical categorization)’의 원리를 따르는데, 범주는 특정한 자질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닮음의 구조를 이루며, 범주의 구성원은 등가적이 아니라 원형에서부터 주변에 이르기까지 등급적이며, 범주의 경계는 뚜렷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하다고 본다. 원형 범주화에 기반을 둔 인지언어학에서는 범주 및 의미 구조가 언어 외적 요소인 인간의 인지적, 신체 경험적,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의미 구조의 비대칭성 및 가치 우열에 주목한다(임지룡 2006 참조).
2.2. 동기화
소쉬르 이래로 언어에서 형태-의미의 관계는 상징어를 제외하고는 ‘자의적(arbitrary)’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언어의 형태와 의미 간에는 필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형태와 의미 간에 ‘동기화(motivation)’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언어의 형태 또는 구조와 의미의 관계에 대해 설명이 가능함을 뜻한다. 즉 왜 어떤 언어적 형태가 주어진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왜 어떤 의미가 주어진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을 그 형태와 의미가 동기화되어 있다고 한다. 동기화와 관련하여 Lakoff(1987: 346)에서는 언어에서 자의적이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경우는 ‘동기화되어(motivated)’ 있다고 하였다. 동기화는 더 구체적으로 ‘도상성(icionicity)’이라고 하는데, 이는 형태와 의미 간의 닮음, 또는 언어 구조와 개념 구조 간에 존재하는 상관성을 가리킨다. 도상성에는 ‘도상적 양’, ‘도상적 순서’, ‘도상적 거리’의 원리 등이 있다(임지룡 2008: 323-345 참조).
2.3. 백과사전적 의미관
단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율주의 언어학에서는 순수한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과 화자의 ‘백과사전적 지식(encyclopedic knowledge)’을 엄격히 분리하고, 의미 분석의 대상을 ‘언어적 지식’으로 국한했다. 여기서 단어의 백과사전적 지식 또는 의미란 그 단어에서 상기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킨다.
그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의미를 언어적 지식과 세상사의 지식, 즉 백과사전적 지식 속에 들어 있는 인지 구조로 보고 그 둘의 뚜렷한 구분을 부정하며, 단어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본다. 백과사전적 의미관의 특징 다섯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Hamawand 2016: 149 참조).
첫째, 의미적 지식과 화용적 지식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한 어휘항목의 의미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사용되는 방식의 지식을 포함하며, 따라서 한 어휘항목의 실제 의미는 화용적 의미가 된다. 둘째, 백과사전적 지식은 하나의 망으로 조직화된다. 이 경우 관련된 의미 양상들은 비대칭적이다. 셋째, 의미는 문맥또는 맥락의 한 결과이다. 한 어휘항목이 사용되는 문맥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백과사전적 정보에 기여한다. 넷째, 어휘항목들은 특정한 개념과 관련된 지식의 방대한 창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다섯째, 한 어휘항목이 접근을 제공하는 백과사전적 지식은 역동적이다. 즉 새로운 경험들은 늘 그 어휘항목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제1부ㆍ의미관계의 이해와 연구
제1장 /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지형도
1. 들머리
이 글의 목적은 의미 연구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밝히고,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의 바탕 위에서 탐구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지형도를 그리는 데 있다. ‘의미관계(meaning relation)’가 갖는 의의는 관계를 통해 어떤 단어가 의미나 개념적으로 다른 단어와 관련을 맺으면서 그 위상과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의미관계는 구조주의적 의미 연구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으면서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중 의미의 계열관계는 어휘소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이며, 결합관계는 어휘소가 횡적으로 맺는 관계이다. 이 관점에서는 의미관계를 포착함으로써 (추상적인) 의미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 표현의 의미를 의미관계 속에서 다른 표현들과 맺는 관계의 합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이라고 하는데(Cruse 2000: 96-102, 2001: 242-244 참조), 단어의 의미란 해당 언어의 모든 다른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발상이다. 이처럼 구조의미론에서는 ‘의의(sense)’란 독립적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동일한 체계 속의 대조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의미관계에 대한 구조의미론은 언어의 의미관계를 계열적 관계와 결합적 관계를 통해 어휘 의미의 구조 또는 체계의 수립과 이해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 관점은 의미를 언어 자체의 관계적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므로 의미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의미 구조는 엄격한 언어 내적 관계들의 방대한 연산이 되는 것으로, 화자들이 이 세상을 개념화하는 방식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의미관계는 인지언어학의 주된 관심 분야가 되지 못하였으며, 그 성과도 제한되어 있다. 인지적 경향은 어휘 의미 연구의 여러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Croft & Cruse(2004: 141)의 언급처럼 “인지언어학자들은 대체로 의의관계에 대해 말할 것이 거의 없었다(Cognitive linguistics, for the most part, have had very little to say on the topic.).” 의미관계에 대한 인지언어학 이전과 이후를 가늠할 경우, 인지적 접근을 통해 의미관계에 새로운 빛을 비춘 시도는 Croft & Cruse(2004: 141)의 “의의관계란 단어들 자체 간의 의미관계가 아니라, 단어들의 특별한 문맥적 해석 간의 의미관계로 간주x된다.”라는 언급을 통해서이다. 이것은 의미관계가 한층 더 유연하고 역동적인 관계임을 뜻한다. 의미관계에 대한 구조의미론의 ‘언어 자체의 내적 의미관계’에 대한 탐구에서 인지언어학의 ‘문맥과 상황에서 역동적인 해석 간의 의미관계’에 대한 탐구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의미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의미관계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려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의미관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계열관계와 결합관계의 주요 연구 내용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방법론
여기서는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주요 방법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1. 원형 범주화
구조주의를 비롯한 객관주의 또는 자율언어학에서는 의미의 구조나 작용 방식을 대칭적, 평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 중심적 관점(logocentric view)’으로 ‘고전 범주화(classical categorization)’의 세계관에 뿌리를 둔 것인데, 범주는 필요 충분한 특정 자질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등가적이며, 범주의 경계는 명확하다고 본다.
그 반면, 인지언어학은 ‘인간 중심적 관점(anthropocentric view)’으로 ‘원형 범주화(prototypical categorization)’의 원리를 따르는데, 범주는 특정한 자질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닮음의 구조를 이루며, 범주의 구성원은 등가적이 아니라 원형에서부터 주변에 이르기까지 등급적이며, 범주의 경계는 뚜렷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하다고 본다. 원형 범주화에 기반을 둔 인지언어학에서는 범주 및 의미 구조가 언어 외적 요소인 인간의 인지적, 신체 경험적,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의미 구조의 비대칭성 및 가치 우열에 주목한다(임지룡 2006 참조).
2.2. 동기화
소쉬르 이래로 언어에서 형태-의미의 관계는 상징어를 제외하고는 ‘자의적(arbitrary)’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언어의 형태와 의미 간에는 필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형태와 의미 간에 ‘동기화(motivation)’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언어의 형태 또는 구조와 의미의 관계에 대해 설명이 가능함을 뜻한다. 즉 왜 어떤 언어적 형태가 주어진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왜 어떤 의미가 주어진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을 그 형태와 의미가 동기화되어 있다고 한다. 동기화와 관련하여 Lakoff(1987: 346)에서는 언어에서 자의적이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경우는 ‘동기화되어(motivated)’ 있다고 하였다. 동기화는 더 구체적으로 ‘도상성(icionicity)’이라고 하는데, 이는 형태와 의미 간의 닮음, 또는 언어 구조와 개념 구조 간에 존재하는 상관성을 가리킨다. 도상성에는 ‘도상적 양’, ‘도상적 순서’, ‘도상적 거리’의 원리 등이 있다(임지룡 2008: 323-345 참조).
2.3. 백과사전적 의미관
단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율주의 언어학에서는 순수한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과 화자의 ‘백과사전적 지식(encyclopedic knowledge)’을 엄격히 분리하고, 의미 분석의 대상을 ‘언어적 지식’으로 국한했다. 여기서 단어의 백과사전적 지식 또는 의미란 그 단어에서 상기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킨다.
그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의미를 언어적 지식과 세상사의 지식, 즉 백과사전적 지식 속에 들어 있는 인지 구조로 보고 그 둘의 뚜렷한 구분을 부정하며, 단어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본다. 백과사전적 의미관의 특징 다섯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Hamawand 2016: 149 참조).
첫째, 의미적 지식과 화용적 지식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한 어휘항목의 의미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사용되는 방식의 지식을 포함하며, 따라서 한 어휘항목의 실제 의미는 화용적 의미가 된다. 둘째, 백과사전적 지식은 하나의 망으로 조직화된다. 이 경우 관련된 의미 양상들은 비대칭적이다. 셋째, 의미는 문맥또는 맥락의 한 결과이다. 한 어휘항목이 사용되는 문맥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백과사전적 정보에 기여한다. 넷째, 어휘항목들은 특정한 개념과 관련된 지식의 방대한 창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다섯째, 한 어휘항목이 접근을 제공하는 백과사전적 지식은 역동적이다. 즉 새로운 경험들은 늘 그 어휘항목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머리말
제1부ㆍ의미관계의 이해와 연구
제1장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지형도 임지룡
제2부ㆍ의미관계의 국어학적 탐색
제2장 유의어 ‘사람’과 ‘인간’의 사용 양상 송현주
제3장 ‘살다’와 ‘죽다’의 대립성 해석 임태성
제4장 다의어의 의미 구조와 의미 확장 양상 김령환
제5장 관용표현의 유의관계와 대립관계 김정아
제3부ㆍ의미관계의 교육학적 탐색
제6장 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남택승
제7장 국어 반의어 교육 내용 제안 김억조
제8장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이해 이소림
제9장 한국어 연결어미 ‘-(으)ㄴ/는데’의 유의성 함계임
제4부ㆍ의미관계의 대조언어학적 탐색
제10장 한?일어 의미관계 대조 요시모토 하지메(吉本一)
제11장 ‘밝다’와 ‘환하다’의 유의관계 석수영(昔秀?)
제12장 다의어에 나타난 대립관계와 해석 왕난난(王楠楠)
제13장 한국어 ‘죽다’와 중국어 ‘死’의 다의 분석 리우팡(劉芳)
찾아보기
제1부ㆍ의미관계의 이해와 연구
제1장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지형도 임지룡
제2부ㆍ의미관계의 국어학적 탐색
제2장 유의어 ‘사람’과 ‘인간’의 사용 양상 송현주
제3장 ‘살다’와 ‘죽다’의 대립성 해석 임태성
제4장 다의어의 의미 구조와 의미 확장 양상 김령환
제5장 관용표현의 유의관계와 대립관계 김정아
제3부ㆍ의미관계의 교육학적 탐색
제6장 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남택승
제7장 국어 반의어 교육 내용 제안 김억조
제8장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이해 이소림
제9장 한국어 연결어미 ‘-(으)ㄴ/는데’의 유의성 함계임
제4부ㆍ의미관계의 대조언어학적 탐색
제10장 한?일어 의미관계 대조 요시모토 하지메(吉本一)
제11장 ‘밝다’와 ‘환하다’의 유의관계 석수영(昔秀?)
제12장 다의어에 나타난 대립관계와 해석 왕난난(王楠楠)
제13장 한국어 ‘죽다’와 중국어 ‘死’의 다의 분석 리우팡(劉芳)
찾아보기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