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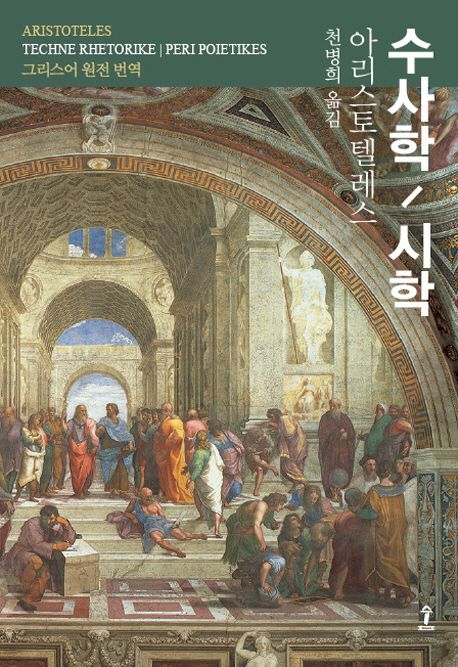
-
수사학 / 시학 (그리스어 원전 번역)
저자 : 아리스토텔레스
출판사 : 숲
출판년 : 2017
ISBN : 9788991290747
책소개
국내 최초 희랍어 원전번역의 수사학과 시학을 만나다!
『수사학 / 시학』은 희랍어 원전번역 《수사학》과 2017년 새 번역 《시학》을 함께 엮은 책이다. 설득력을 전제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은 일종에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자기 논지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아르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연설을 셋으로 나눈다. 이 세 가지 연설을 위아여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논한다.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확고한 신념은 예술은 본질적으로 모방이고, 인간 삶의 모방은 시뿐 아니라 음악, 무용, 그림, 조각 등 모든 예술 형식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원천이며, 예술가는 유사점들을 지적하여 이를테면 이것은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하고 헤아려 알게 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한다.
『수사학 / 시학』은 희랍어 원전번역 《수사학》과 2017년 새 번역 《시학》을 함께 엮은 책이다. 설득력을 전제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은 일종에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자기 논지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아르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연설을 셋으로 나눈다. 이 세 가지 연설을 위아여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논한다.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확고한 신념은 예술은 본질적으로 모방이고, 인간 삶의 모방은 시뿐 아니라 음악, 무용, 그림, 조각 등 모든 예술 형식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원천이며, 예술가는 유사점들을 지적하여 이를테면 이것은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하고 헤아려 알게 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한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국내 최초 희랍어 원전번역 과 2017년 새 번역 을 한 권으로 묶었다.
민주정치와 토론이 활발하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자기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타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시민의 일상이었다. 정치인들도 민중을 상대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 정치적 제안, 선동가에 대한 논박을 해야 했다. 청중들의 감정을 고양시키는가 하면 가라앉히는 기술이 필요했고, 그러자면 인간 감정의 종류와 그 개개의 특성들, 설득의 말은 그 시작과 끝이 어떠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이 일반적이고 흔했기에 법적인 원리와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죄를 증명하거나 논박하려면 수사학에 기대지 않고는 배심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었다.
설득력을 전제하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하거나, 비판이 아닌 비난을 동원하는 주장은 모두 억지거나 일종의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간파한 것일까. 그는 『수사학』에서 자기 논지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나 정치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논의 문화를 재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연설을 셋으로 나눈다. 대중을 상대로 무엇을 권유하거나 만류하는 심의용 연설 또는 정치 연설이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축제나 추도식 등의 행사에서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집회에서 누군가를 탄핵하는 연설로 과시용 연설이라 불렀다. 세 번째로,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변론하는 법정 연설이 있다. 청중 또는 재판관에게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우선 자기는 어떤 성격(ethos)의 소유자이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 나서 청중 또는 재판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들의 감정(pathos)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logos) 설명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연설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세세히 논한다.
수사학 자체는 민주주의와 성쇠를 같이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로마의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를 거쳐 중세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그의 『수사학』을 출발로 삼지 않고서 새로운 수사학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eri poietikes)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체계적인 문예 창작 이론서로 간주되지만, 어떻게 하면 훌륭한 비극을 작시(作詩)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저술되었다. 마치 그의 『수사학』이 연설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론서이지만,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 저술된 것과 같다. 여기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하고 있는 ‘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아니라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이다. 그 시대에는 문학이란 개념조차 없었지만 그의 그리스 비극 창작론은 오늘날에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서사 예술(소설, 연극, 영화) 전반에 유효한 이론을 담고 있다.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확고한 신념은 예술은 본질적으로 모방이고, 인간 삶의 모방은 시뿐 아니라 음악, 무용, 그림, 조각 등 모든 예술 형식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원천이며, 예술가는 유사점들을 지적하여 이를테면 이것은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하고 헤아려 알게 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플라톤이 모방의 부정적 기능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통 이상의 인간을 모방하느냐 보통 이하의 인간을 모방하느냐에 따라(비극은 보통 이상의 인간을, 희극은 보통 이하의 인간을 모방한다), 그리고 서술하느냐(서사시) 실제로 연기하느냐에 따라 (극)시를 구분한다. 그는 비극과 희극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나서,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듣기 좋게 맛을 낸 언어를 사용하되 이를 작품의 각 부분에 종류별로 따로 삽입한다. 비극은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서술 형식을 취하지 않는데,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실현한다”고 비극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비극의 구성 요소 여섯 가지는 플롯, 성격, 조사, 사상, 볼거리, 노래인데, 비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플롯은 일정한 크기를 가진 단일한 행위를 재현해야 하며, 시인의 목표는 재현을 통해 (남들을 위해) 연민과 (자신을 위해)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관객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훌륭한 사람이 억누르고자 하는 감정들을 북돋운다고 하여 비극을 깎아내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정신건강에 유익할 수도 있다고 완곡히 주장한다.
『시학』의 새 번역은 옥스퍼드 클래시컬 텍스트(Oxford Classical Texts)에서 이미 폐기된 바이워터(I. Bywater)의 교열본 대신 카셀의 교열본을 할리웰(S. Halliwell)이 다시 교열한 것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였다.
민주정치와 토론이 활발하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자기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타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시민의 일상이었다. 정치인들도 민중을 상대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 정치적 제안, 선동가에 대한 논박을 해야 했다. 청중들의 감정을 고양시키는가 하면 가라앉히는 기술이 필요했고, 그러자면 인간 감정의 종류와 그 개개의 특성들, 설득의 말은 그 시작과 끝이 어떠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이 일반적이고 흔했기에 법적인 원리와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죄를 증명하거나 논박하려면 수사학에 기대지 않고는 배심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었다.
설득력을 전제하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하거나, 비판이 아닌 비난을 동원하는 주장은 모두 억지거나 일종의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간파한 것일까. 그는 『수사학』에서 자기 논지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나 정치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논의 문화를 재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연설을 셋으로 나눈다. 대중을 상대로 무엇을 권유하거나 만류하는 심의용 연설 또는 정치 연설이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축제나 추도식 등의 행사에서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집회에서 누군가를 탄핵하는 연설로 과시용 연설이라 불렀다. 세 번째로,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변론하는 법정 연설이 있다. 청중 또는 재판관에게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우선 자기는 어떤 성격(ethos)의 소유자이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 나서 청중 또는 재판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들의 감정(pathos)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logos) 설명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연설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세세히 논한다.
수사학 자체는 민주주의와 성쇠를 같이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로마의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를 거쳐 중세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그의 『수사학』을 출발로 삼지 않고서 새로운 수사학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eri poietikes)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체계적인 문예 창작 이론서로 간주되지만, 어떻게 하면 훌륭한 비극을 작시(作詩)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저술되었다. 마치 그의 『수사학』이 연설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론서이지만,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 저술된 것과 같다. 여기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하고 있는 ‘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아니라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이다. 그 시대에는 문학이란 개념조차 없었지만 그의 그리스 비극 창작론은 오늘날에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서사 예술(소설, 연극, 영화) 전반에 유효한 이론을 담고 있다.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확고한 신념은 예술은 본질적으로 모방이고, 인간 삶의 모방은 시뿐 아니라 음악, 무용, 그림, 조각 등 모든 예술 형식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원천이며, 예술가는 유사점들을 지적하여 이를테면 이것은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하고 헤아려 알게 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플라톤이 모방의 부정적 기능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통 이상의 인간을 모방하느냐 보통 이하의 인간을 모방하느냐에 따라(비극은 보통 이상의 인간을, 희극은 보통 이하의 인간을 모방한다), 그리고 서술하느냐(서사시) 실제로 연기하느냐에 따라 (극)시를 구분한다. 그는 비극과 희극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나서,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듣기 좋게 맛을 낸 언어를 사용하되 이를 작품의 각 부분에 종류별로 따로 삽입한다. 비극은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서술 형식을 취하지 않는데,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실현한다”고 비극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비극의 구성 요소 여섯 가지는 플롯, 성격, 조사, 사상, 볼거리, 노래인데, 비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플롯은 일정한 크기를 가진 단일한 행위를 재현해야 하며, 시인의 목표는 재현을 통해 (남들을 위해) 연민과 (자신을 위해)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관객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훌륭한 사람이 억누르고자 하는 감정들을 북돋운다고 하여 비극을 깎아내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정신건강에 유익할 수도 있다고 완곡히 주장한다.
『시학』의 새 번역은 옥스퍼드 클래시컬 텍스트(Oxford Classical Texts)에서 이미 폐기된 바이워터(I. Bywater)의 교열본 대신 카셀의 교열본을 할리웰(S. Halliwell)이 다시 교열한 것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였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옮긴이 서문 5
주요 연대표 14
일러두기 18
참고문헌 453
수사학 Techne rhetorike 19
시학 Peri poietikes 337
수사학 차례
제1권
제1장 수사학의 본성 (1354a~1355b)
제2장 수사학의 정의 (1355b~1358a)
제3장 수사학의 종류 (1358a~1359a)
제4장 심의 범위 (1359a~1360b)
제5장 행복 (1360b~1362a)
제6장 좋음 (1362a~1363b)
제7장 상대적 유용성 (1363b~1365b)
제8장 정체들 (1365b~1366a)
제9장 과시용 연설 (1366a~1368a)
제10장 불의 (1368b~1369b)
제11장 즐거움 (1369b~1372a)
제12장 범죄 심리 (1372a~1373a)
제13장 범죄와 처벌 (1373b~1374b)
제14장 상대적으로 중대한 범죄들 (1374b~1375a)
제15장 기술(技述) 외적 설득 수단들 (1375a~1377b)
제2권
제1장 감정과 성격의 역할 (1377b~1378a)
제2장 분노 (1378a~1380a)
제3장 차분함 (1380a~1380b)
제4장 우정과 적개심 (1380b~1382a)
제5장 두려움과 자신감 (1382a~1383b)
제6장 수치심 (1383b~1385a)
제7장 호의 (1385a~1385b)
제8장 연민 (1385b~1386b)
제9장 분개 (1386b~1387b)
제10장 시기 (1387b~1388a)
제11장 경쟁심 (1388a~1388b)
제12장 성격, 청년기 (1388b~1389b)
제13장 노년기 (1389b~1390a)
제14장 한창때 (1390a~1390b)
제15장 출생 (1390b~1390b)
제16장 부(富) (1390b~1391a)
제17장 권력 (1391a~1391b)
제18장 공통된 논제들 (1391b~1392a)
제19장 가능성의 문제 (1392a~1393a)
제20장 예증 (1393a~1394a)
제21장 금언 (1394a~1395b)
제22장 생략삼단논법 (1395b~1397a)
제23장 증명하는 논제들 (1397a~1400b)
제24장 실체 없는 논제들 (1400b~1402a)
제25장 논박 (1402a~1403a)
제26장 확대와 축소 (1403a~1403b)
제3권
제1장 역사적 개관 (1403b~1404a)
제2장 명료성 (1404b~1405b)
제3장 무미건조함 (1405b~1406b)
제4장 직유 (1406b~1407a)
제5장 정확성 (1407a~1407b)
제6장 숭고 (1407b~1408a)
제7장 적절성 (1408a~1408b)
제8장 리듬 (1408b~1409a)
제9장 문장론 (1409a~1410b)
제10장 재치와 은유 (1410b~1411b)
제11장 생생함 (1411b~1413b)
제12장 장르에의 적합성 (1413b~1414a)
제13장 진술과 증명 (1414a~1414b)
제14장 도입부 (1414b~1416a)
제15장 선입관 (1416a~1416b)
제16장 진술 (1416b~1417b)
제17장 증거와 반증 (1417b~1418b)
제18장 반문(反問) (1418b~1419b)
제19장 맺는말 (1419b~1420a)
시학 차례
PART 1 모방의 주요 형식으로서 비극과 서사시와 희극에 관한 예비적 고찰
제1장 시는 사용 수단에 의해 구별된다
제2장 시는 그 대상에 의해 구별된다
제3장 시는 모방 양식에 의해 구별된다
제4장 시와 그 여러 종류의 기원과 발전
제5장 희극과 서사시
PART 2 비극의 정의와 그 구성 법칙
제6장 비극의 정의와 그 질적 요소의 분석
제7∼11장 플롯
제7장 극의 배열과 길이
제8장 행동의 통일성
제9장 시인은 있을 법한 것과 보편적인 것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장 단순한 플롯과 복합적인 플롯
제11장 급반전·발견·수난
제12장 비극의 양적 요소
제13∼14장 플롯은 어떻게 구성해야 비극의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가
제13장 비극의 주인공
제14장 비극적 행위
제15장 비극에서 등장인물 성격에 관한 법칙들, 무대 위 기계 장치 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
제16∼18장 플롯의 고찰에 대한 여론
제16장 발견의 여러 형태
제17∼18장 극의 구성에 대한 부칙
제19장 비극의 등장인물의 사상
제20∼22장비극의 조사(措辭)
제20장 언어의 궁극적 구성 요소
제21장 조사의 종류
제22장 조사의 특징
PART 3 서사시의 구성 법칙
제23장 서사시는 행동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4장 서사시와 비극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5장 서사시 또는 비극에 대한 가능한 비판과 이에 대한 답변
제26장 비극은 서사시보다 더 우수한 예술이다
주요 연대표 14
일러두기 18
참고문헌 453
수사학 Techne rhetorike 19
시학 Peri poietikes 337
수사학 차례
제1권
제1장 수사학의 본성 (1354a~1355b)
제2장 수사학의 정의 (1355b~1358a)
제3장 수사학의 종류 (1358a~1359a)
제4장 심의 범위 (1359a~1360b)
제5장 행복 (1360b~1362a)
제6장 좋음 (1362a~1363b)
제7장 상대적 유용성 (1363b~1365b)
제8장 정체들 (1365b~1366a)
제9장 과시용 연설 (1366a~1368a)
제10장 불의 (1368b~1369b)
제11장 즐거움 (1369b~1372a)
제12장 범죄 심리 (1372a~1373a)
제13장 범죄와 처벌 (1373b~1374b)
제14장 상대적으로 중대한 범죄들 (1374b~1375a)
제15장 기술(技述) 외적 설득 수단들 (1375a~1377b)
제2권
제1장 감정과 성격의 역할 (1377b~1378a)
제2장 분노 (1378a~1380a)
제3장 차분함 (1380a~1380b)
제4장 우정과 적개심 (1380b~1382a)
제5장 두려움과 자신감 (1382a~1383b)
제6장 수치심 (1383b~1385a)
제7장 호의 (1385a~1385b)
제8장 연민 (1385b~1386b)
제9장 분개 (1386b~1387b)
제10장 시기 (1387b~1388a)
제11장 경쟁심 (1388a~1388b)
제12장 성격, 청년기 (1388b~1389b)
제13장 노년기 (1389b~1390a)
제14장 한창때 (1390a~1390b)
제15장 출생 (1390b~1390b)
제16장 부(富) (1390b~1391a)
제17장 권력 (1391a~1391b)
제18장 공통된 논제들 (1391b~1392a)
제19장 가능성의 문제 (1392a~1393a)
제20장 예증 (1393a~1394a)
제21장 금언 (1394a~1395b)
제22장 생략삼단논법 (1395b~1397a)
제23장 증명하는 논제들 (1397a~1400b)
제24장 실체 없는 논제들 (1400b~1402a)
제25장 논박 (1402a~1403a)
제26장 확대와 축소 (1403a~1403b)
제3권
제1장 역사적 개관 (1403b~1404a)
제2장 명료성 (1404b~1405b)
제3장 무미건조함 (1405b~1406b)
제4장 직유 (1406b~1407a)
제5장 정확성 (1407a~1407b)
제6장 숭고 (1407b~1408a)
제7장 적절성 (1408a~1408b)
제8장 리듬 (1408b~1409a)
제9장 문장론 (1409a~1410b)
제10장 재치와 은유 (1410b~1411b)
제11장 생생함 (1411b~1413b)
제12장 장르에의 적합성 (1413b~1414a)
제13장 진술과 증명 (1414a~1414b)
제14장 도입부 (1414b~1416a)
제15장 선입관 (1416a~1416b)
제16장 진술 (1416b~1417b)
제17장 증거와 반증 (1417b~1418b)
제18장 반문(反問) (1418b~1419b)
제19장 맺는말 (1419b~1420a)
시학 차례
PART 1 모방의 주요 형식으로서 비극과 서사시와 희극에 관한 예비적 고찰
제1장 시는 사용 수단에 의해 구별된다
제2장 시는 그 대상에 의해 구별된다
제3장 시는 모방 양식에 의해 구별된다
제4장 시와 그 여러 종류의 기원과 발전
제5장 희극과 서사시
PART 2 비극의 정의와 그 구성 법칙
제6장 비극의 정의와 그 질적 요소의 분석
제7∼11장 플롯
제7장 극의 배열과 길이
제8장 행동의 통일성
제9장 시인은 있을 법한 것과 보편적인 것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장 단순한 플롯과 복합적인 플롯
제11장 급반전·발견·수난
제12장 비극의 양적 요소
제13∼14장 플롯은 어떻게 구성해야 비극의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가
제13장 비극의 주인공
제14장 비극적 행위
제15장 비극에서 등장인물 성격에 관한 법칙들, 무대 위 기계 장치 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
제16∼18장 플롯의 고찰에 대한 여론
제16장 발견의 여러 형태
제17∼18장 극의 구성에 대한 부칙
제19장 비극의 등장인물의 사상
제20∼22장비극의 조사(措辭)
제20장 언어의 궁극적 구성 요소
제21장 조사의 종류
제22장 조사의 특징
PART 3 서사시의 구성 법칙
제23장 서사시는 행동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4장 서사시와 비극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5장 서사시 또는 비극에 대한 가능한 비판과 이에 대한 답변
제26장 비극은 서사시보다 더 우수한 예술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