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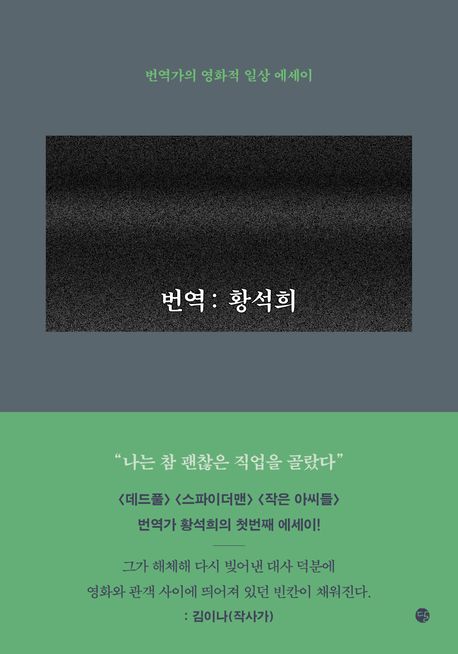
-
번역: 황석희 (번역가의 영화적 일상 에세이)
저자 : 황석희
출판사 : 달
출판년 : 2023
ISBN : 9791158161743
책소개
“번역가는 대사에서 풍기는 뉘앙스를 판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참 괜찮은 직업을 골랐다”
엔딩크레디트 속 ‘번역: 황석희’ 너머
자막 없이 보는 번역가의 일상 번역
우리 삶에서 ‘번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영화관이다. 도서에도 번역은 존재하지만, 표기는 대체로 ‘옮김’이고 저자 이름의 옆 또는 하단에 적혀 있어 부러 찾아야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만나는 ‘번역’ 글자는 엔딩크레디트 중에서도 맨 마지막, 그것도 크레디트와 다른 위치에 대체로 큰 글자로 튀어나온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다. 물론 상영관 불이 켜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말이다.
스크린 속 ‘번역’이란 글자 옆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이름 석 자가 있다면 ‘황석희’일 것이다. 그 이름이 뜨는 순간 좌석 곳곳에서 “역시 황석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번역가로서 잘 알려진 황석희가 이번엔 ‘작가 황석희’로, 관객이 아닌 독자를 찾아왔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인 ‘번역 황석희’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 황석희』는 저자가 일과 일상에서 느낀 단상을 ‘자막 없이’ 편안하게 풀어쓴 에세이다. 한 줄에 열두 자라는 자막의 물리적 한계와 정역(定譯)해야 한다는 표현의 제한에서 벗어나 저자는 스크린 밖에서 마음껏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 자유로운 글들은 SNS에도 올라왔던 몇몇 게시물들과 더불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데드풀〉 〈스파이더맨〉 〈파친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느꼈던 직업인으로서의 희노애락, 업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언중에 대한 생각과 내밀한 속마음까지. 그는 번역가답게 자기 앞의 일상을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 번역해냈다. 언어학도 번역학도 아닌 이 책의 제목이 『번역: 황석희』로 붙여진 이유 중 하나다.
저자가 해석한 일상은 우리 곁에도 존재한다. 그러니 그의 번역본을 보면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번역하며 살아왔는지, 오역과 의역이 남발하는 이 일상 번역이 서로 얼마나 닮아 있고 다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한 일상을 새로이 번역할 낯선 시선을 하나 얻어갈 것이다.
“늘 정역에 묶여 있는 저는 이렇게 일상을 부담 없이 번역해 세상에 내보인다는 게 묘한 일탈처럼 즐겁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번역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번역가거든요”
나의 일상을 잘 번역하려면
영화 번역은 혼잣말이나 대화, 즉 사람의 말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에 가깝다. 대본에 적혀 있는 대사는 사람의 입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뉘앙스라는 옷을 두르고 새로운 의미를 품기 때문에 번역을 단순 해석이라 말하기엔 부족하다. 저자의 말처럼 번역은 발화자의 표정과 동작, 목소리 톤을 살펴 “뉘앙스의 냄새를 판별”하는 작업이라 봐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대뜸 “사실 우리는 누구나 번역가”라고 말한다. 번역을 언어 사이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모든 표의와 상징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보면 우리 삶은 번역이 필요한 순간으로 가득하다는 뜻이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연인에게서 받은 ‘끝나면 잠깐 보자’라는 문자는 둘 사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장들로 번역할 수 있다. 상사가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이 점심시간이 아니라 회의시간이라면 발표자는 긴장하게 된다. 다만, 일상 번역에 정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연인은 그저 심심했을 수 있고 상사는 그날따라 눈이 뻑뻑했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기에 대화에는 항상 ‘빈칸’이 존재한다. 그 틈을 허투루 알거나 무시해버리면 오해와 자의적 해석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심히 관찰하고 짐작하며 조심조심 다음 ‘대사’를 말할 수밖에 없다. 기실 말은 원래 그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캐릭터들의 대사를 약 100만 개 가까이 번역하며, 그간 쌓은 노련함을 자신의 현실에 대입한다. 언제든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언어를 무기처럼 구체화하여 사용”하는 “후진 사람”이 되지 말고, “있어 보이는 척” 타인의 노력을 꺾지 말고, 오지랖 같은 “어긋난 호의”를 보이지 말자고. 아직도 번역이 어렵다 말하는 저자지만, 그의 섬세한 작업은 우리의 일상을 배려있게 번역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오역하게 된다면 어쩔까. 그럴 땐 상대에게 정중히 되물으면 그만이다. 감독이나 작가가 이역만리에 있는 영화 번역가와 달리 우리는 다행히도 그 진의를 설명해줄 상대방이 (대개는) 눈앞에 있다. 다시금 뉘앙스의 힌트를 구하고 실수했다면 정정하면 된다. 여러 갈래로 읽을 수 있어 헷갈리겠지만 그 갈림길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 숨어 있다. “일상의 번역은 오역이면 오역, 의역이면 의역 그 나름의 재미가 있”으니까.
나는 참 괜찮은 직업을 골랐다”
엔딩크레디트 속 ‘번역: 황석희’ 너머
자막 없이 보는 번역가의 일상 번역
우리 삶에서 ‘번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영화관이다. 도서에도 번역은 존재하지만, 표기는 대체로 ‘옮김’이고 저자 이름의 옆 또는 하단에 적혀 있어 부러 찾아야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만나는 ‘번역’ 글자는 엔딩크레디트 중에서도 맨 마지막, 그것도 크레디트와 다른 위치에 대체로 큰 글자로 튀어나온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다. 물론 상영관 불이 켜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말이다.
스크린 속 ‘번역’이란 글자 옆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이름 석 자가 있다면 ‘황석희’일 것이다. 그 이름이 뜨는 순간 좌석 곳곳에서 “역시 황석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번역가로서 잘 알려진 황석희가 이번엔 ‘작가 황석희’로, 관객이 아닌 독자를 찾아왔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인 ‘번역 황석희’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 황석희』는 저자가 일과 일상에서 느낀 단상을 ‘자막 없이’ 편안하게 풀어쓴 에세이다. 한 줄에 열두 자라는 자막의 물리적 한계와 정역(定譯)해야 한다는 표현의 제한에서 벗어나 저자는 스크린 밖에서 마음껏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 자유로운 글들은 SNS에도 올라왔던 몇몇 게시물들과 더불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데드풀〉 〈스파이더맨〉 〈파친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느꼈던 직업인으로서의 희노애락, 업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언중에 대한 생각과 내밀한 속마음까지. 그는 번역가답게 자기 앞의 일상을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 번역해냈다. 언어학도 번역학도 아닌 이 책의 제목이 『번역: 황석희』로 붙여진 이유 중 하나다.
저자가 해석한 일상은 우리 곁에도 존재한다. 그러니 그의 번역본을 보면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번역하며 살아왔는지, 오역과 의역이 남발하는 이 일상 번역이 서로 얼마나 닮아 있고 다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한 일상을 새로이 번역할 낯선 시선을 하나 얻어갈 것이다.
“늘 정역에 묶여 있는 저는 이렇게 일상을 부담 없이 번역해 세상에 내보인다는 게 묘한 일탈처럼 즐겁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번역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번역가거든요”
나의 일상을 잘 번역하려면
영화 번역은 혼잣말이나 대화, 즉 사람의 말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에 가깝다. 대본에 적혀 있는 대사는 사람의 입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뉘앙스라는 옷을 두르고 새로운 의미를 품기 때문에 번역을 단순 해석이라 말하기엔 부족하다. 저자의 말처럼 번역은 발화자의 표정과 동작, 목소리 톤을 살펴 “뉘앙스의 냄새를 판별”하는 작업이라 봐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대뜸 “사실 우리는 누구나 번역가”라고 말한다. 번역을 언어 사이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모든 표의와 상징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보면 우리 삶은 번역이 필요한 순간으로 가득하다는 뜻이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연인에게서 받은 ‘끝나면 잠깐 보자’라는 문자는 둘 사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장들로 번역할 수 있다. 상사가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이 점심시간이 아니라 회의시간이라면 발표자는 긴장하게 된다. 다만, 일상 번역에 정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연인은 그저 심심했을 수 있고 상사는 그날따라 눈이 뻑뻑했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기에 대화에는 항상 ‘빈칸’이 존재한다. 그 틈을 허투루 알거나 무시해버리면 오해와 자의적 해석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심히 관찰하고 짐작하며 조심조심 다음 ‘대사’를 말할 수밖에 없다. 기실 말은 원래 그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캐릭터들의 대사를 약 100만 개 가까이 번역하며, 그간 쌓은 노련함을 자신의 현실에 대입한다. 언제든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언어를 무기처럼 구체화하여 사용”하는 “후진 사람”이 되지 말고, “있어 보이는 척” 타인의 노력을 꺾지 말고, 오지랖 같은 “어긋난 호의”를 보이지 말자고. 아직도 번역이 어렵다 말하는 저자지만, 그의 섬세한 작업은 우리의 일상을 배려있게 번역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오역하게 된다면 어쩔까. 그럴 땐 상대에게 정중히 되물으면 그만이다. 감독이나 작가가 이역만리에 있는 영화 번역가와 달리 우리는 다행히도 그 진의를 설명해줄 상대방이 (대개는) 눈앞에 있다. 다시금 뉘앙스의 힌트를 구하고 실수했다면 정정하면 된다. 여러 갈래로 읽을 수 있어 헷갈리겠지만 그 갈림길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 숨어 있다. “일상의 번역은 오역이면 오역, 의역이면 의역 그 나름의 재미가 있”으니까.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번역가는 대사에서 풍기는 뉘앙스를 판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참 괜찮은 직업을 골랐다”
엔딩크레디트 속 ‘번역: 황석희’ 너머
자막 없이 보는 번역가의 일상 번역
우리 삶에서 ‘번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영화관이다. 도서에도 번역은 존재하지만, 표기는 대체로 ‘옮김’이고 저자 이름의 옆 또는 하단에 적혀 있어 부러 찾아야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만나는 ‘번역’ 글자는 엔딩크레디트 중에서도 맨 마지막, 그것도 크레디트와 다른 위치에 대체로 큰 글자로 튀어나온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다. 물론 상영관 불이 켜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말이다.
스크린 속 ‘번역’이란 글자 옆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이름 석 자가 있다면 ‘황석희’일 것이다. 그 이름이 뜨는 순간 좌석 곳곳에서 “역시 황석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번역가로서 잘 알려진 황석희가 이번엔 ‘작가 황석희’로, 관객이 아닌 독자를 찾아왔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인 ‘번역 황석희’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 황석희』는 저자가 일과 일상에서 느낀 단상을 ‘자막 없이’ 편안하게 풀어쓴 에세이다. 한 줄에 열두 자라는 자막의 물리적 한계와 정역(定譯)해야 한다는 표현의 제한에서 벗어나 저자는 스크린 밖에서 마음껏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 자유로운 글들은 SNS에도 올라왔던 몇몇 게시물들과 더불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데드풀> <스파이더맨> <파친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느꼈던 직업인으로서의 희노애락, 업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언중에 대한 생각과 내밀한 속마음까지. 그는 번역가답게 자기 앞의 일상을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 번역해냈다. 언어학도 번역학도 아닌 이 책의 제목이 『번역: 황석희』로 붙여진 이유 중 하나다.
저자가 해석한 일상은 우리 곁에도 존재한다. 그러니 그의 번역본을 보면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번역하며 살아왔는지, 오역과 의역이 남발하는 이 일상 번역이 서로 얼마나 닮아 있고 다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한 일상을 새로이 번역할 낯선 시선을 하나 얻어갈 것이다.
“늘 정역에 묶여 있는 저는 이렇게 일상을 부담 없이 번역해 세상에 내보인다는 게 묘한 일탈처럼 즐겁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번역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번역가거든요”
나의 일상을 잘 번역하려면
영화 번역은 혼잣말이나 대화, 즉 사람의 말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에 가깝다. 대본에 적혀 있는 대사는 사람의 입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뉘앙스라는 옷을 두르고 새로운 의미를 품기 때문에 번역을 단순 해석이라 말하기엔 부족하다. 저자의 말처럼 번역은 발화자의 표정과 동작, 목소리 톤을 살펴 “뉘앙스의 냄새를 판별”하는 작업이라 봐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대뜸 “사실 우리는 누구나 번역가”라고 말한다. 번역을 언어 사이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모든 표의와 상징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보면 우리 삶은 번역이 필요한 순간으로 가득하다는 뜻이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연인에게서 받은 ‘끝나면 잠깐 보자’라는 문자는 둘 사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장들로 번역할 수 있다. 상사가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이 점심시간이 아니라 회의시간이라면 발표자는 긴장하게 된다. 다만, 일상 번역에 정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연인은 그저 심심했을 수 있고 상사는 그날따라 눈이 뻑뻑했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기에 대화에는 항상 ‘빈칸’이 존재한다. 그 틈을 허투루 알거나 무시해버리면 오해와 자의적 해석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심히 관찰하고 짐작하며 조심조심 다음 ‘대사’를 말할 수밖에 없다. 기실 말은 원래 그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캐릭터들의 대사를 약 100만 개 가까이 번역하며, 그간 쌓은 노련함을 자신의 현실에 대입한다. 언제든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언어를 무기처럼 구체화하여 사용”하는 “후진 사람”이 되지 말고, “있어 보이는 척” 타인의 노력을 꺾지 말고, 오지랖 같은 “어긋난 호의”를 보이지 말자고. 아직도 번역이 어렵다 말하는 저자지만, 그의 섬세한 작업은 우리의 일상을 배려있게 번역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오역하게 된다면 어쩔까. 그럴 땐 상대에게 정중히 되물으면 그만이다. 감독이나 작가가 이역만리에 있는 영화 번역가와 달리 우리는 다행히도 그 진의를 설명해줄 상대방이 (대개는) 눈앞에 있다. 다시금 뉘앙스의 힌트를 구하고 실수했다면 정정하면 된다. 여러 갈래로 읽을 수 있어 헷갈리겠지만 그 갈림길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 숨어 있다. “일상의 번역은 오역이면 오역, 의역이면 의역 그 나름의 재미가 있”으니까.
나는 참 괜찮은 직업을 골랐다”
엔딩크레디트 속 ‘번역: 황석희’ 너머
자막 없이 보는 번역가의 일상 번역
우리 삶에서 ‘번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영화관이다. 도서에도 번역은 존재하지만, 표기는 대체로 ‘옮김’이고 저자 이름의 옆 또는 하단에 적혀 있어 부러 찾아야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만나는 ‘번역’ 글자는 엔딩크레디트 중에서도 맨 마지막, 그것도 크레디트와 다른 위치에 대체로 큰 글자로 튀어나온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다. 물론 상영관 불이 켜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말이다.
스크린 속 ‘번역’이란 글자 옆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이름 석 자가 있다면 ‘황석희’일 것이다. 그 이름이 뜨는 순간 좌석 곳곳에서 “역시 황석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번역가로서 잘 알려진 황석희가 이번엔 ‘작가 황석희’로, 관객이 아닌 독자를 찾아왔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인 ‘번역 황석희’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 황석희』는 저자가 일과 일상에서 느낀 단상을 ‘자막 없이’ 편안하게 풀어쓴 에세이다. 한 줄에 열두 자라는 자막의 물리적 한계와 정역(定譯)해야 한다는 표현의 제한에서 벗어나 저자는 스크린 밖에서 마음껏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 자유로운 글들은 SNS에도 올라왔던 몇몇 게시물들과 더불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데드풀> <스파이더맨> <파친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느꼈던 직업인으로서의 희노애락, 업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언중에 대한 생각과 내밀한 속마음까지. 그는 번역가답게 자기 앞의 일상을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 번역해냈다. 언어학도 번역학도 아닌 이 책의 제목이 『번역: 황석희』로 붙여진 이유 중 하나다.
저자가 해석한 일상은 우리 곁에도 존재한다. 그러니 그의 번역본을 보면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번역하며 살아왔는지, 오역과 의역이 남발하는 이 일상 번역이 서로 얼마나 닮아 있고 다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한 일상을 새로이 번역할 낯선 시선을 하나 얻어갈 것이다.
“늘 정역에 묶여 있는 저는 이렇게 일상을 부담 없이 번역해 세상에 내보인다는 게 묘한 일탈처럼 즐겁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번역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번역가거든요”
나의 일상을 잘 번역하려면
영화 번역은 혼잣말이나 대화, 즉 사람의 말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에 가깝다. 대본에 적혀 있는 대사는 사람의 입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뉘앙스라는 옷을 두르고 새로운 의미를 품기 때문에 번역을 단순 해석이라 말하기엔 부족하다. 저자의 말처럼 번역은 발화자의 표정과 동작, 목소리 톤을 살펴 “뉘앙스의 냄새를 판별”하는 작업이라 봐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대뜸 “사실 우리는 누구나 번역가”라고 말한다. 번역을 언어 사이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모든 표의와 상징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보면 우리 삶은 번역이 필요한 순간으로 가득하다는 뜻이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연인에게서 받은 ‘끝나면 잠깐 보자’라는 문자는 둘 사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장들로 번역할 수 있다. 상사가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이 점심시간이 아니라 회의시간이라면 발표자는 긴장하게 된다. 다만, 일상 번역에 정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연인은 그저 심심했을 수 있고 상사는 그날따라 눈이 뻑뻑했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기에 대화에는 항상 ‘빈칸’이 존재한다. 그 틈을 허투루 알거나 무시해버리면 오해와 자의적 해석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심히 관찰하고 짐작하며 조심조심 다음 ‘대사’를 말할 수밖에 없다. 기실 말은 원래 그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캐릭터들의 대사를 약 100만 개 가까이 번역하며, 그간 쌓은 노련함을 자신의 현실에 대입한다. 언제든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언어를 무기처럼 구체화하여 사용”하는 “후진 사람”이 되지 말고, “있어 보이는 척” 타인의 노력을 꺾지 말고, 오지랖 같은 “어긋난 호의”를 보이지 말자고. 아직도 번역이 어렵다 말하는 저자지만, 그의 섬세한 작업은 우리의 일상을 배려있게 번역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오역하게 된다면 어쩔까. 그럴 땐 상대에게 정중히 되물으면 그만이다. 감독이나 작가가 이역만리에 있는 영화 번역가와 달리 우리는 다행히도 그 진의를 설명해줄 상대방이 (대개는) 눈앞에 있다. 다시금 뉘앙스의 힌트를 구하고 실수했다면 정정하면 된다. 여러 갈래로 읽을 수 있어 헷갈리겠지만 그 갈림길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 숨어 있다. “일상의 번역은 오역이면 오역, 의역이면 의역 그 나름의 재미가 있”으니까.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5 추천사
6 프롤로그
1부 최대 두 줄, 한 줄에 열두 자
14 왁스 재킷을 샀다
20 농아라고 쓰시면 안 돼요
26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해야지
32 망작과 아빠의 눈물샘
36 영화 보는 일이 숙제가 될 때
42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48 영화 번역가는 자막 봐요?
54 쿨한 번역가
60 엄마는 그런 줄만 알았다
66 우린 어쩌다 이렇게 후진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70 강연을 수락하기 어려운 건
74 영화 번역가를 그만두는 꿈을 꿨다
78 번역의 신 황석희
2부 나는 참 괜찮은 직업을 골랐다
86 어쩌다가 됐어요
94 투명한 번역
102 세상 모든 오지랖에 부쳐
108 영화 번역가로서 가장 기분좋은 순간
114 번역가의 개입
124 관객의 언어
130 너 그래서 복받은 거야
136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140 부산 사람 다 되셨네예
146 아는 만큼 보이고, 알려진 만큼 보여지는
152 낭비할 시간, 잔뜩 있어
158 싹을 밟아주겠어
164 띄어쓰기좀틀리면어때요
172 뉘앙스의 냄새를 맡는 사람
3부 1500가지 뉘앙스의 틈에서
180 윤여정, 할리우드를 ‘존경하지 않는다’ 밝혀
188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닐 때
192 취존이 어렵나?
198 응큼한 번역
204 결국에 가면 다 부질없으니까
210 번역가님도 오역이 있네요?
214 영화 번역가가 드라마 주인공이 되다니
222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
228 영원불멸한 자막의 전설
234 생각의 속도
240 혼자 하는 번역은 없다
246 마음껏 미워할 수 없는
252 내가 몰랐던 감사 인사
258 그대들의 거짓말이 현실이 되기를
6 프롤로그
1부 최대 두 줄, 한 줄에 열두 자
14 왁스 재킷을 샀다
20 농아라고 쓰시면 안 돼요
26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해야지
32 망작과 아빠의 눈물샘
36 영화 보는 일이 숙제가 될 때
42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48 영화 번역가는 자막 봐요?
54 쿨한 번역가
60 엄마는 그런 줄만 알았다
66 우린 어쩌다 이렇게 후진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70 강연을 수락하기 어려운 건
74 영화 번역가를 그만두는 꿈을 꿨다
78 번역의 신 황석희
2부 나는 참 괜찮은 직업을 골랐다
86 어쩌다가 됐어요
94 투명한 번역
102 세상 모든 오지랖에 부쳐
108 영화 번역가로서 가장 기분좋은 순간
114 번역가의 개입
124 관객의 언어
130 너 그래서 복받은 거야
136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140 부산 사람 다 되셨네예
146 아는 만큼 보이고, 알려진 만큼 보여지는
152 낭비할 시간, 잔뜩 있어
158 싹을 밟아주겠어
164 띄어쓰기좀틀리면어때요
172 뉘앙스의 냄새를 맡는 사람
3부 1500가지 뉘앙스의 틈에서
180 윤여정, 할리우드를 ‘존경하지 않는다’ 밝혀
188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닐 때
192 취존이 어렵나?
198 응큼한 번역
204 결국에 가면 다 부질없으니까
210 번역가님도 오역이 있네요?
214 영화 번역가가 드라마 주인공이 되다니
222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
228 영원불멸한 자막의 전설
234 생각의 속도
240 혼자 하는 번역은 없다
246 마음껏 미워할 수 없는
252 내가 몰랐던 감사 인사
258 그대들의 거짓말이 현실이 되기를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